[한경칼럼] 도전과 응전..성준경 <모아유통 사장>
기억이 난다.
황하강 나일강이 모두 그러했다. 그런데 차차 나이가 들면서 느낀것은
고대문명국가들이 한결같이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근대 문명을 이끌어오고 있는 나라는 대체로 남쪽의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북쪽의 좀 춥고 별로 비옥하지도 못한 지역의 나라들이 아닌가.
구미제국 특히 그중에서도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등 중북구나라들은
춥고 음산한 나라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잘 살고 못사는,소위 경제적 문명이냐 문화냐 하는
것은 물질적 조건보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런 나의 생각을 확인시켜준 것이 미국의 피터 드러커교수
였다. 드러커교수는 그의 저서인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그 나라의
부는 부존자원보다도 그 나라 국민의 관리기술수준에 더 의존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고 깊이 공감했다.
더욱이 토인비교수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을 읽고부터 그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토인비교수는 이책에서 현존하는 문화권은 자연적
조건보다는 이에 대처한 인간의 반응,즉 응전방식에 있다고 설파하였다.
근래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큰 도전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이에 대처한 우리들의 응전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농과대학 도서관의 책을 끄집어내어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법에서 부터
종자개량에 열심인 어느 신부의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UR가 어찌 우리 농업만의 문제이겠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 도전속에 살고 있고 그 응전
방식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
삶은 부단한 도전과 응전의 연속적 과정이 아니겠는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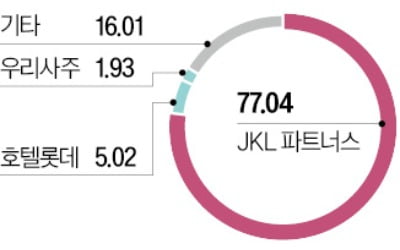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