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생명과 선택에 관한 묵직한 질문 '분지의 두 여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직 경찰관이 바라본 삶과 죽음 '있었던 존재들'
조앤 디디온 미발표 에세이 '내 말의 의미는'
![[신간] 생명과 선택에 관한 묵직한 질문 '분지의 두 여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KR20240119082500005_01_i_P4.jpg)
▲ 분지의 두 여자 = 강영숙 지음.
북쪽 도시 B에는 비밀리에 대리모를 의뢰자와 연결해주는 한 클리닉이 있다.
딸을 범죄로 잃은 대학교수 진영은 고민 끝에 타인을 위해 생명을 잉태하겠다는 생각으로 대리모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또 다른 여성 샤오는 남편과의 불화로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생계가 막막해지자 딸을 위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대리모가 되겠다고 나선다.
오민준은 서울 남쪽 지역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다.
사람들이 버리고 유기한 것들을 치우고 처리하는 게 일인데, 어느 새벽 한 공원의 조형물 뒤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다.
무엇엔가 홀린 듯 그는 아기를 데려오고, 울지 않는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겁을 먹고 아이를 병원에 둔 채 달아난다.
이 아기를 유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또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김유정문학상과 이효석 문학상을 받은 강영숙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분지의 두 여자'는 생명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의 존엄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듯한 재해 같은 현대 사회에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 실존의 문제를 묵직하게 건드린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애를 낳아 키운 건 잘한 일일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225쪽)
은행나무. 232쪽.
![[신간] 생명과 선택에 관한 묵직한 질문 '분지의 두 여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KR20240119082500005_02_i_P4.jpg)
▲ 있었던 존재들 = 원도 지음.
현직 경찰관인 작가가 지난 2년간 한 일간지에 연재한 칼럼을 다듬어 묶어낸 책이다.
4년간 과학수사과에서 현장 감식 업무를 맡으며 수백명의 변사자를 본 저자는 투신자살, 고독사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수습하며 느낀 것들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비상', '단속', '부패' 등 현장에서 포착한 스물아홉 개의 단어의 의미와 사건을 접목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전한다.
단어 '고개'엔 달동네 쪽방촌에서 고독사한 사람의 이야기가, '심연'엔 주머니마다 돌을 가득 넣은 채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겼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자살로 처리된 변사자 수만 1만2천727명에 달한다.
하루에 34.8명꼴로 자살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지 모른다.
매일매일을 사는 게 전쟁이다.
이들을 '변사자' 대신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한 '전사자'로 부르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174쪽)
현직 경찰관이면서 필명 '원도'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는 이 책 전에는 '경찰관 속으로', '아무튼, 언니'를 펴냈다.
세미콜론. 192쪽.
![[신간] 생명과 선택에 관한 묵직한 질문 '분지의 두 여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KR20240119082500005_03_i_P4.jpg)
▲ 내 말의 의미는 = 조앤 디디온 지음. 김희정 옮김.
미국 작가 조앤 디디온(1934~2021)의 미출간 에세이 12편을 모은 책이다.
사회 비평적인 글부터 지극히 사적인 내용의 글까지 주제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글들이다.
소설처럼 읽히는 탄탄한 내러티브의 저널리즘을 추구했던 '뉴 저널리즘'의 선구자로 꼽히는 저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글도 있다.
수록 에세이 '앨리시아와 대안 언론'에서 작가는 언론이 취해야 할 자세 중 독자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언급한다.
또 작가는 자신의 대학 실패 경험을 회고하며 현대 사회의 지나친 교육열을 꼬집는가 하면,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상장기업 대표로 성공한 마사 스튜어트를 분석하면서 여성을 바라보는 현대 사회의 삐딱하고 불공정한 시각을 꼬집는다.
조앤 디디온은 1950년대 미국의 패션지 '보그'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 각종 소설과 논픽션, 시나리오로 필명을 널리 알렸다.
2005년에는 남편이 작고한 뒤 1년간 있었던 일과 생각을 쓴 논픽션 '상실'로 전미도서상(내셔널북어워드)를 받았다.
책읽는수요일. 240쪽.
/연합뉴스
조앤 디디온 미발표 에세이 '내 말의 의미는'
![[신간] 생명과 선택에 관한 묵직한 질문 '분지의 두 여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KR20240119082500005_01_i_P4.jpg)
북쪽 도시 B에는 비밀리에 대리모를 의뢰자와 연결해주는 한 클리닉이 있다.
딸을 범죄로 잃은 대학교수 진영은 고민 끝에 타인을 위해 생명을 잉태하겠다는 생각으로 대리모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또 다른 여성 샤오는 남편과의 불화로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생계가 막막해지자 딸을 위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대리모가 되겠다고 나선다.
오민준은 서울 남쪽 지역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다.
사람들이 버리고 유기한 것들을 치우고 처리하는 게 일인데, 어느 새벽 한 공원의 조형물 뒤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다.
무엇엔가 홀린 듯 그는 아기를 데려오고, 울지 않는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겁을 먹고 아이를 병원에 둔 채 달아난다.
이 아기를 유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또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김유정문학상과 이효석 문학상을 받은 강영숙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분지의 두 여자'는 생명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의 존엄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듯한 재해 같은 현대 사회에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 실존의 문제를 묵직하게 건드린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애를 낳아 키운 건 잘한 일일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225쪽)
은행나무. 232쪽.
![[신간] 생명과 선택에 관한 묵직한 질문 '분지의 두 여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KR20240119082500005_02_i_P4.jpg)
현직 경찰관인 작가가 지난 2년간 한 일간지에 연재한 칼럼을 다듬어 묶어낸 책이다.
4년간 과학수사과에서 현장 감식 업무를 맡으며 수백명의 변사자를 본 저자는 투신자살, 고독사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수습하며 느낀 것들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비상', '단속', '부패' 등 현장에서 포착한 스물아홉 개의 단어의 의미와 사건을 접목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전한다.
단어 '고개'엔 달동네 쪽방촌에서 고독사한 사람의 이야기가, '심연'엔 주머니마다 돌을 가득 넣은 채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겼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자살로 처리된 변사자 수만 1만2천727명에 달한다.
하루에 34.8명꼴로 자살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지 모른다.
매일매일을 사는 게 전쟁이다.
이들을 '변사자' 대신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한 '전사자'로 부르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174쪽)
현직 경찰관이면서 필명 '원도'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는 이 책 전에는 '경찰관 속으로', '아무튼, 언니'를 펴냈다.
세미콜론. 192쪽.
![[신간] 생명과 선택에 관한 묵직한 질문 '분지의 두 여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KR20240119082500005_03_i_P4.jpg)
미국 작가 조앤 디디온(1934~2021)의 미출간 에세이 12편을 모은 책이다.
사회 비평적인 글부터 지극히 사적인 내용의 글까지 주제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글들이다.
소설처럼 읽히는 탄탄한 내러티브의 저널리즘을 추구했던 '뉴 저널리즘'의 선구자로 꼽히는 저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글도 있다.
수록 에세이 '앨리시아와 대안 언론'에서 작가는 언론이 취해야 할 자세 중 독자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언급한다.
또 작가는 자신의 대학 실패 경험을 회고하며 현대 사회의 지나친 교육열을 꼬집는가 하면,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상장기업 대표로 성공한 마사 스튜어트를 분석하면서 여성을 바라보는 현대 사회의 삐딱하고 불공정한 시각을 꼬집는다.
조앤 디디온은 1950년대 미국의 패션지 '보그'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 각종 소설과 논픽션, 시나리오로 필명을 널리 알렸다.
2005년에는 남편이 작고한 뒤 1년간 있었던 일과 생각을 쓴 논픽션 '상실'로 전미도서상(내셔널북어워드)를 받았다.
책읽는수요일. 240쪽.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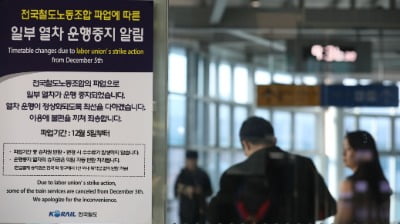
![[속보]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도 무정차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러브레터' 여주인공, 사망원인은 '히트쇼크'?…대체 뭐길래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3.1494477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