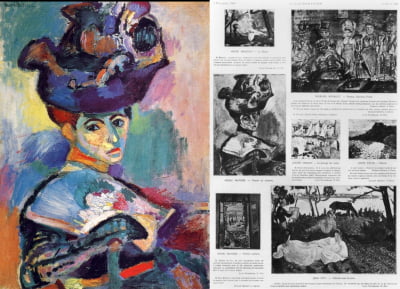무수한 손을 거쳐 완성되는 '일인용 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rte] 김동휘의 탐나는 책
신해욱 지음
<일인용 책> (봄날의책, 2015)
신해욱 지음
<일인용 책> (봄날의책, 2015)

여기까지도 이미 허용치 초과의 끼워 맞춤일 수 있(었)겠으나, 사명은 세 개 이상의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기어이 하나를 더 끌어들이고 마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일인용 출판사’다. 오락실 비디오 게임 시절 일인용 ‘일피’, 대전용 ‘이피’ 할 때 싱글 플레이어를 뜻하는 1P 말이다. (기어이 한 발 더 나아가 P는 주기율표상 인의 원소기호이기도 하므로 ‘일+인’이 된다는 비약까지 시도하였으나, 다행히도 이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만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돌이켜보면 결과물은 심란에 가까웠다. 그러나 나름대로 상호명의 심오를 추구하던 때, 책은 누구에게나 ‘일인용’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TV는 가족과 보면 즐겁고,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하고, 음악은 공연장 라이브가 진짜라고 믿었던 때. 그러나 독서의 시간은 온전히 일인용이다. 독서모임을 위해 같은 책을 저마다 읽어오기도, 친구에게 빌린 책을 돌려 읽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활자를 읽어나가는 동안은 책과 나, 기필코 둘뿐이다. 온전히 나만의 속도로, 그러니까 읽는 일에 있어선 저자조차 그 속도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해욱 시인의 산문집이 <일인용 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을 때, 나는 기어이 선수를 빼앗겼다며 분통해 했다는 뜻이다. 언제쯤이면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진정으로 체득할 것이냔 말이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내 이럴 줄 알았지….
물론 정말로 빼앗긴 선수는 그 제목이 아닐 테다. 이 지면의 뜻이 애초 그러하거니와, 내가 정말로 탐낸 것은 신해욱 시인의 글 자체니까. 한 꼭지가 두 쪽 남짓, 편편이 짧은 글이고 그만큼 작은 이야기다. 드림캐처를 처음 달고서 설쳤던 잠. 비행기 좌석 포켓에 두고 내린 책. 지하철 같은 칸에서 같은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난 날. 읽다 보면 알게 된다. 독자의 읽는 시간뿐 아니라 저자의 쓰는 시간 역시 일인용이라는 것. 웃고 사랑하고 곁눈질하고 애도하는 시간 모두 일인용이라는 것. 삶은 누구에게나 일인용, 오롯이 일인분이라는 것.
책은 ‘season’ 1부터 7까지 일곱 계절을 지나는데, 6과 7 사이 한 챕터가 더 자리해 총 8부다. 부제목을 대신한 한 날짜, ‘2014. 4. 16’. 다른 꼭지와 달리 이 챕터의 글들은 쓰인 날짜를 밝혀두었다. 2014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봄부터 가을, 어쩌면 세 계절, 그러나 끝내 흐르지 않았던 어떤 날들을.
이 원고를 위해 책의 목차를 다시 뒤적이다 신형철 평론가(<인생의 역사>)를 경유해 기타노 다케시(<죽기 위해 사는 법>)의 말에 닿는다. “5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50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데 묶어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000건 일어났다’가 맞다.” 삶도 죽음도, 온전한 한 사람의 것이다. 그에 닿은 기억 또한 저마다 일인용, 그러므로 응당 일인분의 책임일 테다.
책 한 권을 만드는 데는 참 많은 손이 든다. 작가의 손에서 글이 나면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를 거쳐 인쇄소와 물류센터와 서점으로 옮겨가며 무수한 손을, 또 품을 거치기 마련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법이니까. 아니, 나은 정도가 아니지, 종이 한 쪽도 맞들어야 들리는 법이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진실 하나. 독자의 품에 안긴 순간 책은 끝내 일인용이라는 것. 독자(獨自)로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 너그러이 당신의 속도에 발맞춘다는 것. 당신의 오늘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