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형의 현장노트] 국악기·양악기의 다채로운 만남…미래가 기억할 오늘의 우리 음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송태형 문화부 선임기자
![[송태형의 현장노트] 국악기·양악기의 다채로운 만남…미래가 기억할 오늘의 우리 음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AA.32448641.1.jpg)
가사가 귀에 맴도는 듯이 친숙한 리코더 선율 위에 앵앵거리는 해금 선율이 얹히며 아련한 동심의 추억에 빠져들게 했다.
지난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4회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아창제) 국악부문’ 연주회 현장. 원일이 지휘하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리코더 연주자 남형주의 협연으로 성찬경 작곡의 리코더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삘릴리’가 초연됐다.
창작관현악의 산실 '아창제'
2007년 출범한 ‘아창제’는 국내 대표적인 창작관현악축제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창작음악제추진위원회가 매년 공모를 통해 국악과 양악부문의 관현악곡을 선정해 다음해 1~2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한다. ‘미래가 기억할 오늘의 우리 음악’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날 연주회에선 ‘삘릴리’를 비롯해 이성현의 ‘희열도 II’, 강솔잎의 생황과 소아쟁 2중 협주곡 ‘샤먼’(사진), 정혁의 산조아쟁 협주곡 ‘검은 집’, 김영삼의 ‘담쟁이’ 등 다섯 곡이 초연됐다. 우리 시대의 사건과 정서, 작곡가의 삶과 심상이 새롭고 도전적인 음악적 실험과 시도를 통해 개성 있게 표출된 작품들이었다.'미래의 클래식' 발굴·육성해야
창작 관현악의 최근 경향 중 하나인 ‘국악기와 양악기의 신선한 조합’도 엿볼 수 있는 무대였다. ‘삘릴리’에서 서양악기인 리코더 독주와 국악관현악이 독특한 조화를 이뤘다면, 국악기인 생황과 소아쟁이 독주 악기로 등장한 ‘샤먼’은 관현악 파트에서 서양악기가 어우러졌다. 첼로와 더블베이스, 클라리넷, 호른, 트롬본, 바순 등 중저음 악기들이 작품에 무게감을 더하며 새로운 소리를 이끌어냈다.다음달 1일 열리는 양악부문 연주회에선 김동명의 ‘반향’, 엄시현의 ‘열대 우림 속 앵무새’, 우미현의 ‘오, 마미’, 이수연의 ‘점과 선으로부터’, 최진석의 ‘음표놀이’ 등을 국립심포니(지휘 정치용)가 초연한다.
아창제는 작곡가들 사이에서 ‘꿈의 무대’로 불린다. 이는 역설적으로 ‘음악의 꽃’인 관현악 작품을 발표할 무대가 극히 드문 현실을 보여준다. 다만 아창제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모 프로젝트나 국공립 오케스트라와 공연장의 신작 위촉이 조금씩 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달 12, 13일 서울시향 정기 연주회 지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야프 판 즈베던 차기 음악감독도 “새로운 음악이 없다면 음악가들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며 “2025년부터는 프로그램의 30%를 한국 작곡가에게 위촉한 신작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오늘의 우리 음악’이 ‘미래가 기억할 클래식’으로 살아남으려면 수용자인 청중의 몫도 크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연주회장에서 가끔씩 만나는 창작음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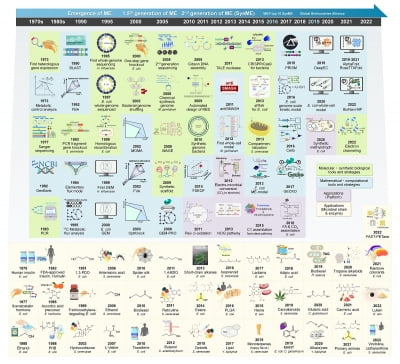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