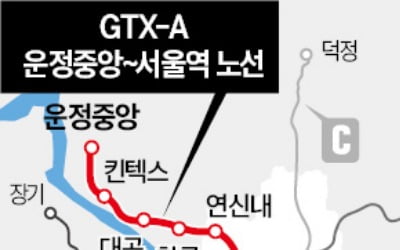[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목 좋은 상가 매입, 실속투자 대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40초반 내 집 사고 여윳돈 투자해 '대박'
부동산 투자에서도 '실속'을 따져야 할 때다.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는 덩치가 있는 매물이 큰 이익을 남기지만, 침체기에는 부침을 덜 타는 작은 부동산이 안전하다. 지금 같은 '투자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적지만 꾸준한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골라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임◌◌씨(56)는 '실속 투자'를 통해 재테크에 성공한 케이스다. 임씨는 젊었을 때 출판사를 운영해 제법 큰돈을 모았다. 40대 초반에 넓은 집을 장만하고 꾸준히 투자금을 모아 뒀다가 최근에야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2년 전부터 수원 시내를 샅샅이 뒤져 수익이 괜찮을 만한 상가 건물을 찾아봤지만 깐깐한 임씨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었다.
마침 아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입지가 좋은 곳의 소형 상가가 급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봐왔던 2개 물건은 서울에 있는 대로변 중형급 상가빌딩. 수익성은 높지 않았지만 입지가 좋아 누가 봐도 투자를 생각할 만한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새로 소개받은 매물은 신도시 쇼핑센터 내 1층 171㎡ 규모의 패스트푸드점 용도의 소규모 상가였다.
임씨의 지인들은 번듯한 건물을 사들이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입을 모았다. 이왕 거금을 들여 투자하는데 덩치 큰 건물이 낫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임씨의 생각은 달랐다. 대로변 중형급 상가빌딩은 임대수익이 연 5% 정도로 덩치만 클 뿐 수익성은 별로였다. 이에 반해 소형 상가는 활용 여하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1층 상가가 위치한 건물은 영화관을 갖춘 복합상가였다. 신도시 택지지구 안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유동인구 확보가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임씨는 서울 역세권의 번듯한 건물 매입을 포기하고 신도시의 쇼핑센터 내 상가를 15억원에 분양받았다. 겉보다는 실속을 선택한 것이다. 임씨는 지난해 상가에다 패스트푸드점을 열었다. 이 패스트푸드점은 매출이 나날이 늘어나는 등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임대보장 상가 샀다 장기 ‘공실’로 경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라는 상가도 철저히 분석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과하게 빚을 내 분양받았던 상가가 몇 년째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남 천안에 사는 박◌◌씨(45)는 서울에 위치한 '목 좋은' 상가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서울에 올라와 매물을 알아보고 다녔다. '목 좋은' 상가를 분양받아 세를 주면 자녀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박씨는 주로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분양 현장을 방문해 돈 될 만한 물건을 물색했다.
'월 100만원 임대수입 보장'이란 상가 광고를 보는 순간 솔깃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M테마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투자를 결심했다. "도심에 위치한 데다 지은 지 오래인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넉넉하니 안심해도 좋다"는 분양업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박씨는 15층짜리 테마상가 중 4층 13㎡ 의류매장 점포 2개를 2억2000만원에 분양받았다. 한 점포만 투자하려 했지만 분양대행사가 대출을 알선해줘 1억 원을 대출받아 점포 두 개를 구입한 것. 한 점포당 월 100만원의 월세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무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점을 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 '대박' 꿈에 사로잡혀 주변에 상가 공급이 많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임대 걱정은 없다던 상가는 문을 연 지 1년이 넘어도 1층 몇 개 점포만 영업할 뿐이다. 나머지 점포는 텅텅 비어 상가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박씨는 요즘 울분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분양업자는 연락두절 상태라 하소연할 곳도 없다. 기대했던 임대수익은커녕 은행 대출이자(월 65만원)만 꼬박꼬박 갚아 나가고 있다. 최근엔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독촉장이 날아왔다. 관리사무소는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분양받은 상가를 경매에 부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