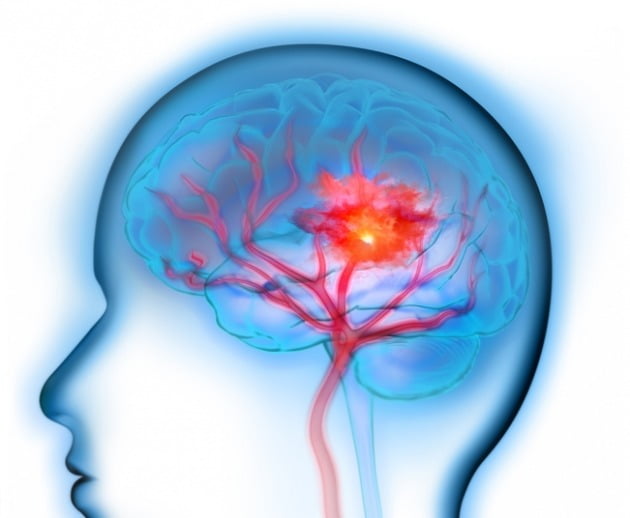"어디까지 클까" 설왕설래 한창
사실 토스는 때를 잘 만났고 기회를 잘 잡았다. 토스가 간편송금을 내놓을 당시 은행까지 세운다는 구상은 없었다. ‘혁신금융’ 성과를 원했던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은행을 밀어붙였고, 네이버가 손사래 치며 빠져나간 자리를 토스가 순발력 있게 꿰찼다. 치과의사 출신 엘리트 창업자라는 ‘스토리’를 가진 이 대표에게 당국과 언론이 우호적이었던 점도 부정할 수 없다.그래도 사업 수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이다. 5~6년 전 토스와 동급이었던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떠올려보면 답이 나온다. 어찌됐든 규제 완화의 혜택을 오롯이 누리며 커온 토스는 이제 제도권 금융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리스크 관리 역량과 수익 창출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토스가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74억달러, 우리 돈으로 8조3000억원이다. 우리금융 시가총액(8조6000억원)에 맞먹는다. 몸값이 과대평가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증시에서 숫자로 확인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토스가 보란듯이 성공하길 바란다. 기업가치가 하나금융(14조원) 신한금융(21조원) KB금융(23조원)을 뛰어넘었다는 뉴스도 기대해본다. 이유는 그냥 하나다. 금융 생태계에 화끈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고인물' 금융산업 더 흔들어주길
올해는 금융지주라는 게 한국에 등장한 지 딱 20년 되는 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제정한 금융지주회사법이 2001년 시행됐다. 몇 차례 인수합병(M&A)을 거쳐 국민·신한·하나·우리 ‘빅4’ 경쟁 구도가 완성된 것도 10년이 됐다. 4대 금융지주는 오랫동안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은 무슨 이득을 봤나. ‘혜택 많이 드릴 테니 제발 이쪽으로 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은행을 본 기억은 없다. 다들 비슷한 상품으로 ‘땅따먹기’를 했다.안정적 과점 체제 속에서 금융권 풍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사 때마다 어느 은행 출신인지 나누고, 관료 출신 낙하산은 곳곳에 착착 꽂힌다. 2021년 은행원 유니폼을 폐지한 게 ‘조직문화 혁신’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인력이 남아돌아도 어쩌질 못한다. 은행들은 당국 규제 탓, 노조 등쌀 탓이라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방패 삼아 오붓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느끼는 외부인도 많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토스의 조직문화는 스타트업 특유의 속도전과 실리콘밸리식 무한경쟁이 결합돼 있다. 이 회사는 업무량이 많고 버티기 힘들다는 세간의 평가를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솔직하게 얘기한다. “워라밸을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일에 몰입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느냐.” 연봉과 복지는 최고 대우를 해주되 철저한 성과주의로 간다는 것이다. 토스가 성공한다면 KT의 케이뱅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등의 성공과는 또 다른 얘기다. ‘금융을 잘 몰랐던 스타트업’이 금융의 판을 더 흔들어줬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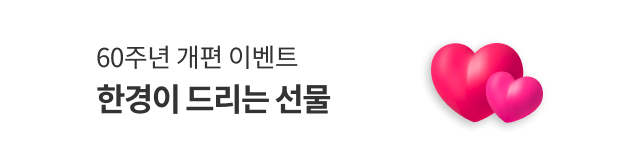
!['싸이월드 코인'이 수상하다 [임현우의 Fin토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500186.3.jpg)
![[임현우의 Fin토크] 은성수 위원장의 '솔직한 심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243160.3.jpg)
![[임현우의 Fin토크]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59520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