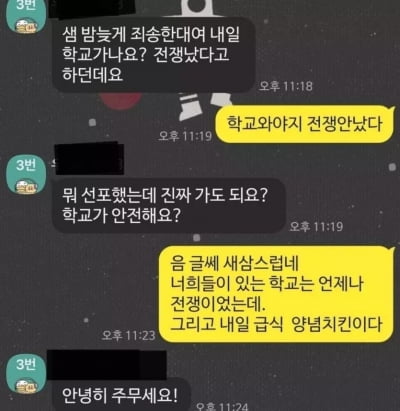계엄군 물러가고 사라진 얼굴들…"40년 흘렀어도 미안함 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재수생이었던 황씨는 버스터미널이 자리했던 금남로 5가의 초입에 자취방을 얻었다.
시궁쥐가 때때로 출몰하는 비좁은 골목을 따라 기름때에 전 공원, 늘상 건들거리는 불량배, 대학에 다니는 하숙생 등 또래 청년이 복작이며 살았다.
지천명을 훌쩍 넘겨 육순에 이른 황씨는 제2의 고향인 광주에서 지금 시내버스 기사로 살아간다.
황씨가 모는 518번 버스는 스무살의 기억이 깃든 거리를 매일같이 달린다.
금남로 5가에서 4가를 거쳐 옛 도청에 이르는 정류장에 버스를 세울 때면 황씨는 문득문득 그해 봄을 떠올린다.
시꺼먼 총을 질러 매고 굵은 몽둥이를 손에 든 군인들로부터 도망치며 숨어다녔던 1980년 5월.
황씨는 "40년이 지났어도 그때만 떠올리면 미안함 뿐"이라고 넋두리했다.

이름도 고향도 몰랐던 얼굴들이 사라졌다.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는 흉흉한 말이 떠돌았다.
"군인의 일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황씨는 오랜 세월 이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이모작 인생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택한 황씨는 4년 남짓한 경력의 절반 정도 기간 518번을 몰았다.
1980년 5월 항쟁 현장을 잇는 518번 버스는 70여개 정류장을 경유한다.
북구와 동구, 서구를 넘나들며 한 차례 운행 시간만 120분에 달한다.
기나긴 노선 가운데 국립 5·18민주묘지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민주로는 금남로와 함께 황씨에게 또 하나의 아픈 공간이다.
길을 따라 늘어선 이팝나무에서 매해 5월이면 피어나는 하얀 꽃 덩이가 자신은 나눠주지 못한 주먹밥을 닮았다.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말주변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으나 매번 긴 이야기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영화나 드라마가 종종 재연하는 1980년 5월 20일은 부슬비가 내렸다가 그친 화요일이다.
그날 저녁 6시 40분쯤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행렬이 도청으로 향했다.
시내 전역에서 공수부대원의 만행을 목격한 운수 노동자가 마음을 모았다.
산발적인 시위가 항쟁으로 치달은 변곡점이었다.
황씨는 지난 1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회차지에서 연합뉴스 기자를 만났던 순간 "518번 버스를 몰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