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3에서는 프로들도 '티 높게' 꽂고 쳐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어프로 리얼레슨 - 임희정
티 안꽂으면 뒤땅 확률 높아져
다운블로로 치든 쓸어치든
임팩트 제대로 되는 게 우선
티 안꽂으면 뒤땅 확률 높아져
다운블로로 치든 쓸어치든
임팩트 제대로 되는 게 우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만 1년을 보낸 임희정(20)은 프로암에서 “티를 조금 더 높게 꽂으라”고 자주 권한다. 주로 아이언으로 티샷 해야 하는 파3에서다. 그는 “티 위에 공을 올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티를 너무 깊숙이 꽂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또 그는 “티를 꽂을 수 있다면 페어웨이에서도 꽂고 싶다”며 “그만큼 티를 꽂고 샷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적당한 높이는 있을까. “시각적으로 편안할 정도로 올려 꽂으면 된다. 내 경우는 손톱 높이만큼 꽂는다”는 게 임희정의 말이다. 그는 “이를 가장 낮은 기준점으로 잡고 클럽이 길어질수록 티를 조금씩 높게 꽂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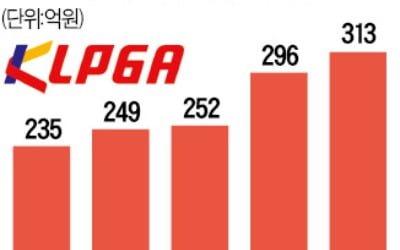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