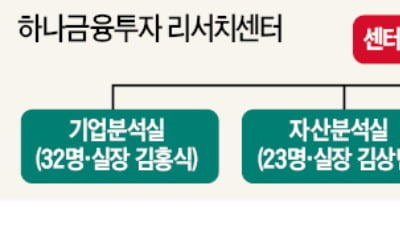'증권사의 꽃'은 옛말…애널리스트 수난시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사 구조조정 1순위
'워라밸 없는 삶' 젊은 세대 기피
'워라밸 없는 삶' 젊은 세대 기피

‘증권사의 꽃’으로 불리던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에게 선망의 직업으로 통했다. 수억원대 연봉에 인센티브도 두둑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증권사 내에서 기피 직종이 됐다. 증권사 신입 직원들은 리서치센터보다 기업금융(IB)이나 자산관리(WM) 부서를 선호한다. 많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벤처캐피털(VC)이나 헤지펀드 업계로 자리를 옮겼다.
인기 업종 1순위였지만…

리서치센터가 ‘비용만 드는 부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은 주식거래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것과 관련이 깊다. 과거에는 증권사 지점을 중심으로 한 주식영업 활동이 활발했다.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한 기업을 분석해 보고서를 내놓으면 증권사 영업사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법인 및 개인 고객들에게 주식을 소개하고 팔았다.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가 급증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늘었다. 자연스레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중요도는 과거보다 줄었다. 여기에다 증권사들이 회사 수익구조의 중심을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에서 IB·WM 등으로 바꾸면서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리서치센터는 구조조정 1순위가 됐다.

애널리스트 수는 줄었는데 업무는 줄어들지 않았다. A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오전에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다녀와서 오후에는 기업탐방을 가야 하고 늦게 들어와 보고서도 써야 한다”며 “야근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애널리스트의 바쁜 일과는 큰 부담이다. 올 7월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 주 52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업계 내에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남의 얘기”라는 푸념이 나온다.
일방적인 부서 배치와 도제식 교육 시스템도 애널리스트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 3년의 RA 생활을 거쳐야 한다. 이후 정규 애널리스트 자리가 나면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충원된다. 경영학 전공자가 자동차 분야를 담당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철강 분야까지 맡는 식이다. 국내 대형증권사 1년차 애널리스트인 최모씨(28)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다”며 “다른 보고서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선배 애널리스트들의 어깨너머로 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이오업종 애널리스트 구하기 힘들어
바이오, 반도체 등 인기 업종은 전문 애널리스트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 과거에는 명문대를 나와 반도체나 바이오 업체에서 실무를 쌓은 인력들이 주로 맡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력을 가진 애널리스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대형증권사들이 아니면 뛰어난 인재들의 연봉 수준을 맞춰줄 수 없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은 인문계열 전공자를 교육해 애널리스트 자리에 앉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위상이 떨어지다보니 보고서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펀드매니저는 “다른 보고서를 베낀 듯한 보고서가 수두룩하다”며 “같은 그래프를 색깔만 달리 해서 내놓거나 영어로 작성된 외국계 리포트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펀드매니저들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실적 등 수치 참고용으로만 쓴다”며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일은 드물다”고 전했다.
보고서의 질이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탐방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정보 비대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