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의료진 판단으로 연명치료 중단 가능" 최종결정

뱅상 랑베르(42)의 가족들은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열흘째인 이날 오전 8시 24분에 렝스의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고 르 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랑베르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두고 가족들이 둘로 갈라져 법정 투쟁까지 벌이면서 프랑스에서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그는 2008년 자동차 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1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다.
상태에 별다른 호전이 없자 2014년 법적인 보호자인 그의 아내와 5명의 형제자매는 프랑스의 소극적 안락사법에 따라 랑베르의 영양과 수분공급을 끊기로 결정했다.
랑베르가 교통사고 전에도 인공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더 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자주 드러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의 부모는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계속 명령을 받아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나서 지난 5월 "신의 선물인 생명을 그 시작부터 자연스러운 끝에 이르기까지 항상 지켜야 한다"면서 부모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형제자매들은 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와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랑베르의 연명치료 중단은 인권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라면서 안락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프랑스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쐐기를 박았다.
랑베르를 담당한 의료진의 자체판단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렝스 병원의 의료진은 지난 2일 랑베르의 수분·영양공급을 끊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정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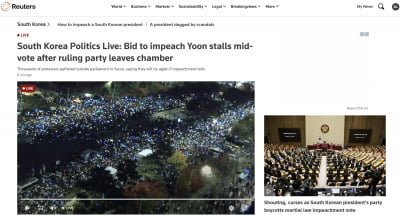
!['탄핵정국' 외신도 높은 관심 보여…日, 실시간 생중계까지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87114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