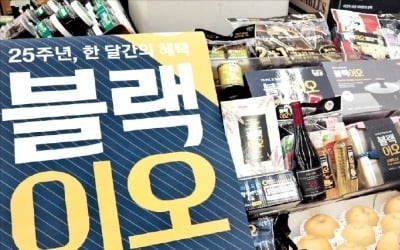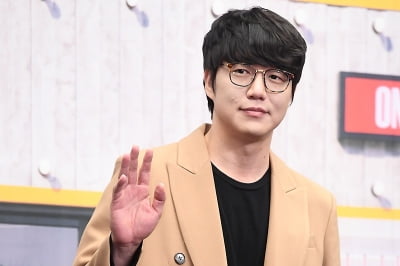허영인 회장, 매년 파리 찾아
한국식 빵 '코팡' 꾸준히 선보여
소보로빵·단팥빵 등 인기 메뉴로
연내 3호점…내년엔 빵공장도

◆韓 식품회사 유일 프랑스 성공스토리
프랑스는 한국 외식 브랜드의 불모지로 꼽힌다. 유럽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식문화를 자랑하기 때문에 엄두조차 못 내는 게 식품업계의 현실이다. ‘빵의 본고장’이라 베이커리 브랜드에는 진입장벽이 더 높다는 게 업계 인식이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배우기만 하던 나라에 가서 우리 빵으로 제대로 된 승부를 해야 한다”고 선언한 건 20년 전이다. 한국에서 파리바게뜨 법인을 세운 지 10년 만인 1998년 프랑스 릴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했다. 밀과 기계를 수입하면서 시장을 두드렸다. 2006년 프랑스 법인을 설립하고 프랑스 원맥을 들여와 국내에 정통 바게트를 출시했다. 품질에 자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고, 2014년 7월 1호점인 샤틀레점을 냈다. 파리 샤틀레점과 오페라점(2호점)은 모두 반죽을 사와 굽기만 하는 스낵매장이 아니라 매장에서 반죽부터 제조까지 하는 브랑제리 형식이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 유기농 인증도 유지하고 있다.

◆철저한 현지화+고급화 통했다
파리바게뜨가 파리에 안착한 비결은 현지화와 고급화다.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한 뒤 신제품을 빨리 내놓는 한국식 기업문화도 큰 역할을 했다. 파리의 다른 빵집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획일화된 빵을 판다면, 파리바게뜨는 메뉴를 계절과 유행에 맞춰 재빨리 바꾸는 방법을 썼다. 두 개 프랑스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28명은 전원 프랑스인이다.
정재우 SPC그룹 프랑스점포사업법인 총괄은 “바게트 문화를 가진 셰프들에게 새로운 주문을 하면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다”며 “지금은 단팥빵, 소보로빵 등 코팡을 찾는 단골이 늘면서 다 함께 팀을 이뤄 연구개발(R&D)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인들은 제철 과일이나 유행하는 식재료 등으로 바뀌는 신제품을 만나는 재미로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2개월 전에는 한국에서 흔한 빵인 피자빵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개점 때부터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실비 카이요 샤틀레점장은 “프랑스의 다른 빵집과 비교해 늘 새롭고 신선한 메뉴가 많다는 평가 때문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좋은 브랑제리의 기준인 바게트, 그것으로 만든 바게트 샌드위치가 특히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SPC그룹의 해외 매장은 지난해 300개를 넘어섰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2030년 매출 20조원, 세계 1만2000개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게 목표다.
파리=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김보라 기자의 알쓸커잡]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마다 커피기계 다르다는데…](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01.181567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