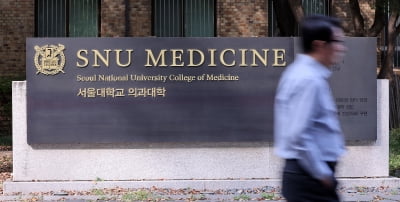무너지는 '지식네트워크'
똑같은 시간 강연하고도 국립대 30만, 사립대 150만원
"연구 결과물 값어치를 법이 가격으로 재단하다니"
◆지식의 유통 사슬 단절
서울대 공대 B교수는 연초 한 공학포럼에서 사립대 교수 두 명과 함께 공동 발제를 맡았다. 행사가 끝나고 주최 측은 B교수에게 30만원, 다른 두 교수에겐 각각 1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참가한 교수 사이에서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 크게 일었다. 주최 측은 이후 모든 행사 참석자의 사례비를 서울대 기준인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발제자도 2시간에 30만원, 토론에 단순 참가한 패널도 똑같이 30만원을 받게 됐다. B교수는 “지식의 값어치가 깊이나 혁신성이 아니라 소속 학교에 따라 매겨지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현실”이라고 씁쓸해했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평교수 기준 국·공립대 교수는 시간당 30만원, 사립대 교수는 100만원으로 강연·기고료의 상한선을 다르게 뒀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대학가에선 이 규정이 한국 사회의 지식 유통 사슬을 단절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학에서 생산된 고급 지식이 사회에 유통되는 경로를 막았다는 것이다.
생명과학분야 선도 연구자로 손꼽히는 서울대 자연대 C교수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부활동 대신 연구에 더 집중하고 있다. C교수는 “나의 연구결과물이 법이 정해놓은 가격에 재단되는 게 싫어 대중 강연을 나가더라도 강연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 간 지식 교류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괜한 구설수를 만들기 싫은 연구자 상당수가 외부활동을 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에서 열리는 학술 포럼이나 교수들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연구소 자문회의에 참가하고 받는 사례금 역시 강연료와 동일한 시간당 20만~30만원이다. 여기서 교통비와 식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다. 지방 국립대 경제학자인 D교수는 “법 시행 후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 지방에 있는 교수들이 초청받는 일 자체가 줄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주제를 논할 적임자가 아니라 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로 행사가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편법 부추기는 ‘지식 금수령’
외부활동에 앞서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를 의무화한 ‘외부강의 신고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교수들은 모든 종류의 외부 강연, 기고, 발표, 토론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엔 강연의 주제, 주최기관, 시간, 장소,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음대 교수의 자선 공연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연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한다. 신문에 싣는 칼럼의 주제까지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법적으로는 소속단체의 장이 기고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
김영란법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편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임직원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한 강연을 자주 갖는 기업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교수들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별도의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발주하면서 그 안에 강연료를 포함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한 국립대 교수는 “김영란법은 21세기판 지식금수령”이라며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이 밖으로 공유되지 않고 상아탑에 그대로 고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속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지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르포] '윤석열' 지우는 대구 서문시장…"尹 욕하는게 싫어 사진 뗐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K.3887887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