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칭 웨지로 퍼터처럼 스트로크… '20야드 칩인 버디'도 꿈 아니죠"
그립을 퍼팅그립으로 바꾸고 공을 오른발 엄지 앞쪽에
팔뚝 세워 웨지와 일체감
클럽헤드 힐 살짝 들어줘야 뒤땅이나 토핑 확률 줄어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면 테이크 어웨이를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곤 했어요. 겨우 샷을 하면 날아가는 공을 보고 공을 친 제가 화들짝 놀라기도 했고요.”

“(무게를) 계속 올려서 110㎏까지 들었어요. 무거울수록 한계를 넘어섰다는 성취감이 강해지더라고요. 거의 중독이죠.”
신체 부위별로 세분해 하루 7시간씩 근육을 다지고 유연성을 키웠다. 그렇게 2년간 자신을 몰아붙인 끝에 얻은 결론이 “입스쯤이야!”였다. 지금은 근육보다 유연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나친 웨이트 트레이닝이 스윙을 되레 흔들어놨기 때문이다.
입스 와중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게 어프로치다. “자신 있는 ‘필살기 클럽’ 하나 정도는 확실히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 클럽만 들면 왠지 힘이 솟는, 그런 거 있잖아요.”
피칭 웨지는 그에게 그런 존재다. 100야드 안팎의 웨지 샷을 좋아해 어떤 식으로든 이 거리를 남기려 애쓴다. 이 웨지의 위력이 200% 발휘될 때가 그린 근처 10~20야드 안팎의 어프로치다. 그립을 퍼팅 그립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 단계. 공을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에 두는 어드레스가 두 번째다. “리딩 에지(클럽 헤드의 날)가 공과 풀 사이로 부드럽게 헤집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안소현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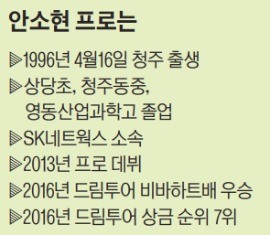
그는 “클럽 헤드가 저절로 공을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퍼팅 스트로크를 하면 된다”며 “손목을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살기 하나가 완성되면 응용 필살기도 한결 쉬워지기 마련.
“피칭 외에도 다양한 클럽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다면 만점이죠. 홀을 35야드 남겨둔 상태에서 23도짜리 유틸리티로 퍼팅한 적도 있는데, 성공하니까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퍼팅하기엔 그린 에지와 공과의 사이에 굴곡이 심했고, 웨지를 쓰기에는 잔디가 너무 짧아 토핑이나 뒤땅 같은 미스샷이 나올 수 있어서였다. 애물단지 같았던 골프가 더 재밌어진 것은 물론이다.
용인=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