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나가는 한국 뮤지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극장 공연·라이선스 계약으로 업그레이드

K뮤지컬 해외 진출 크게 늘어

일부 작품에 한정됐던 K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소극장 뮤지컬은 물론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형 뮤지컬(프랑켄슈타인, 마타하리 등)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류에 기대를 걸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K팝 아이돌 스타를 다수 출연시키거나, 국내에서 오랫동안 공연해 흥행 가능성이 검증된 작품에 국한하던 단계도 뛰어넘었다. 최근에는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류 스타덤에 아직 오르지 않은 배우들로도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린다.
라이선스 계약 등 수출방식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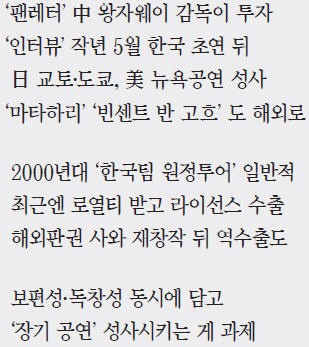
일부 기획사는 해외 판권을 사와 재창작(논레플리카)한 뒤 역수출도 한다. ‘쓰릴 미’가 대표적이다. 이 뮤지컬은 2003년 미국 오프브로드웨이(뉴욕 브로드웨이 외곽의 소극장 거리로 실험적 작품을 많이 공연)에 첫선을 보인 작품. 공연 기획사 달컴퍼니가 이 작품 라이선스를 구입해 2007년 재창작했다. 달컴퍼니는 재창작 버전으로 2011~2014년 모두 일곱 차례 일본 공연을 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공연도 했다.
“외국작품 모방 단계 넘어야”
공연 기획사들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국내 뮤지컬 시장의 성장이 곧 한계에 이를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시장 성장 속도는 더뎌지는 반면 새로 만들어지는 작품 수는 많아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작품 10개를 만들면 9개는 적자를 본다는 얘기도 나온다.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부 교수는 “장기 공연을 해야 티켓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여의치 않아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K뮤지컬 해외 진출 성공의 관건도 역시 공연 기간이란 지적이 많다. 지금은 해외 현지 공연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는 작품이 거의 없고 10일 이하 작품도 수두룩하다. 이유리 서울예술대 예술경영전공 교수는 “뮤지컬 시장이 성숙한 일본에서도 K뮤지컬이 단기 공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혜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면서도 한국만의 독창성이 들어간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