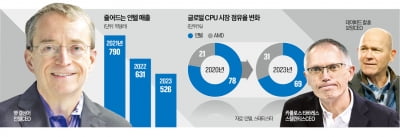내가 쓴 소설 중 가장 재밌는 작품 '엄지 척'
1만권 팔리면 다음 소설 또 쓰겠다"

대하소설 《객주》(10권)를 완간한 지 3년6개월여 만에 78세의 노(老)작가가 다시 장편소설을 내놨다. 오는 30일 발간하는 《뜻밖의 生》(문학동네)이다.
2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출간기념회를 연 김주영 작가는 대뜸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읊었다.

그는 문학의 본질을 ‘위로’라고 정의했다. 김 작가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든 푸시킨처럼 독자, 특히 어둡고 추운 곳에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숙제”라며 펜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간 《뜻밖의 生》엔 작가의 그런 꿈이 담겨 있다. 노인이 된 주인공 박호구가 자신의 성장사를 로드무비 형식을 빌려 돌아보는 이야기다. 노름꾼 아버지와 무당을 믿는 어머니 사이에서 따뜻한 손길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자라난 소년은 옆집 단심이네와 마음을 트고 살지만, 단심이네는 집 나간 남편을 찾아 떠난다. 사소한 사건으로 어머니와도 갈등이 생기자, 그는 집을 나와 단심이네가 키우던 개 칠칠이와 동고동락하며 노숙 생활을 한다. 사라진 칠칠이를 찾아다니다 운동권으로 몰려 강제 징집돼 군대에 다녀오기도 하고, 단심이네는 갑자기 “네 아이”라며 어린 여자아이를 맡기고 떠나버린다. 세상은 그에게 온갖 시련을 가져다주는 것 같지만 주인공은 실망하는 일이 없다. “행복이 별건가 싶었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질 때, 찢어진 우산이라도 준비돼 있다면 그것이 행복일 것이고, 따뜻한 우유 한 잔에도 행복감은 담길 수 있었다”(276쪽)고 주인공은 말한다.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삶을 겪는 이에게 달려 있다는 태도다.
김 작가는 이 소설에 대해 “주인공은 ‘흘러가는 여울물에도 산 그늘이라는 흔적은 남는다’는 철학을 안고 살아간다”며 “누군가 때리면 맞고, 밀면 앞으로 나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절대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고귀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나같이 하찮은 인생이라고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 인생이 뭔지 알아? 걸어다니는 그림자야. 해 떨어지면 사라지는 것이지.”(306쪽)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은 개 칠칠이다. 김 작가가 키웠던 진돗개 이름을 따 지었다.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아 온갖 세상의 풍파를 겪는 주인공을 위로해주는 건 칠칠이다. 주인공을 위로하는 대상을 인간이 아니라 개로 설정한 것에 대해 김 작가는 “사람을 비하할 때 가장 쉽게 지껄이는 말이 ‘개××’이지만 소설에선 그 개가 사람을 가르치고 다스린다”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작품을 놓고 ‘굉장히 재밌다’는 표현도 거침없이 했다. “쓴 사람이 재밌게 느껴야 잘 팔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쓴 소설 중 최고로 재밌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1만권만 팔리면 다음 소설을 또 써보려고 합니다. 껄껄.”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속보]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한국 23번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