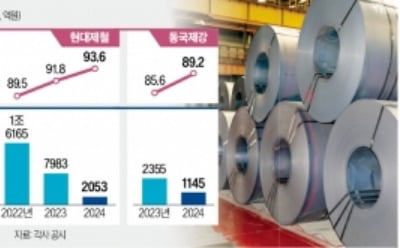전경련 '시련의 계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커버스토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도마’에 올랐다. 1961년 설립돼 ‘재계 대변인’을 자처한 지 55년 만에 해체론(解體論)까지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작년 말부터 주요 기업에서 774억원을 거둬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싸고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4일 재개된 국정감사는 ‘전경련 국감’이 돼버렸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나서 연일 전경련을 비판하고 있다. 오는 12일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정치권의 난타는 계속될 전망이다.
진보단체는 물론 일부 보수단체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전경련 해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회원사들은 전경련이 국민적 논란의 정점에 선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재계 안팎에서 전경련 무용론(無用論)과 함께 이번 기회에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전경련이 재계에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전경련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을 돈줄로만 여기는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전경련이 아무리 변해도 소용없다”고 했다.
장창민/강현우 기자 cmjang@hankyung.com
지난 4일 재개된 국정감사는 ‘전경련 국감’이 돼버렸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나서 연일 전경련을 비판하고 있다. 오는 12일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정치권의 난타는 계속될 전망이다.
진보단체는 물론 일부 보수단체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전경련 해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회원사들은 전경련이 국민적 논란의 정점에 선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재계 안팎에서 전경련 무용론(無用論)과 함께 이번 기회에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전경련이 재계에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전경련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을 돈줄로만 여기는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전경련이 아무리 변해도 소용없다”고 했다.
장창민/강현우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