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국민의 구성상 언제나 세계국가였지만…
고립도 개입도 아닌 보통국가로의 전환이
트럼피즘의 본질, 한국도 진실에 직면하는 시간 왔다"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물론 정치는 언론과의 전쟁이다. 존 F 케네디에게 그토록 협조적이던 미국 언론의 사례는 유명하다.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주가조작과 밀주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무자비하게 투입해 기어이 ‘케네디 신화’를 만들어 냈다. 많은 언론이 매수됐다. 케네디 승리의 계기가 된 TV 토론은, 닉슨이 땀을 많이 흘린다는 사실을 알아낸 조지프 케네디가 방송사 기술진을 매수해 실내온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닉슨이 진땀 흘리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전설도 있다. 대공황기 루스벨트도 언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후버의 뉴딜은 루스벨트의 뉴딜로 영원히 치환됐다. 매카시 의원은 간첩 아닌 언론과 싸워야 했다. 그러니 트럼프를 평가할 때도 보도의 왜곡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한국 총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선거 보도는 친박의 저질 공천 갈등으로만 도배질됐다. 선거의 본말은 뒤집혔다.
미국 언론 보도만 보면 트럼프는 벌써 무너졌어야 했다. 그러나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도 집결하고 있다. 유대인도 가세할 조짐이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자신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1순위로 거론되는 데 대해 애국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트럼프는 이제 샌더스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념도 철학도 없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적이다.
미국은 가장 오래된 근대 국민국가다. 1776년으로 거슬러 가면 벌써 240년이다. 국민이 주인인 첫 네이션 스테이트(민족국가)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나 개별국가 아닌 보편국가요 국제국가요 세계국가였다. 모두가 이민자 출신이었기에 주인과 손님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미국의 개입주의는 종종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을 일으켰다. 구대륙의 낡은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정치를 찾았다. 그게 소위 고립주의의 원천이다. 미국은 자연스레 개별국가를 초월해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었다(폴 존슨의 《미국인의 역사》).
그러나 지금 미국은 뼈와 살을 가진 국민국가로 내려앉고 있다. 제국의 허세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셰일가스도 이런 세계 지정학의 변화를 촉진했다. 트럼프는 패배할지 몰라도 미국 민족주의는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어찌 보면 트럼프는 초기의 히틀러와도 비슷하다. 논쟁적이고 우상파괴적이어서 정치에 염증을 가진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는다. 소위 다양성 신화는 미국의 전통이면서 동시에 지금껏 유럽 좌익의 신화였다. 트럼프는 정면에서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그렇다. 인종과 종교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트럼프에게 이런 단어들은 정치적 금기어의 긴 목록일 뿐이다. 금기어를 무너뜨렸다는 면에서 트럼프는 확실히 우상파괴적이다. 금기어들은 20세기의 대세였고 강요된 정치적 교양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통렬한 어법이다. 솔직한 어투는 노무현과 비슷하고 반(反)FTA 등 경제적 무지는 한국 정치인들의 ‘상식’에 근접해 있다.
미국의 국제적 책임 따위는 부정된다. 누구라도 제국 아닌 강대국으로서의 미국과 대등한 새로운 거래를 터야 한다는 것이 트럼피즘의 골자다. 한국에는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반미(反美)주의 응석이 진실에 직면하는 시간도 다가왔다. 내셔널리즘은 전통의 고립주의와는 다르다. “미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보편국가 미국의 조락이다. 그러나 비아냥거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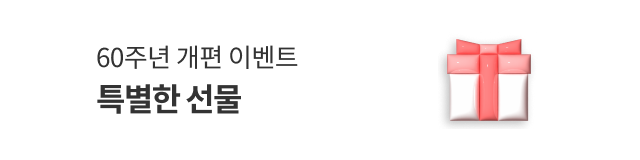

![[토요칼럼] 北 오물 풍선이 두려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4201788.3.jpg)
![[취재수첩] 재고용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에 선 그은 현대차 직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2703579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