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통계에만 매달리는 한국 경제학자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유미 기자의 경제 블랙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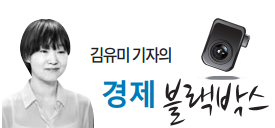
올해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1대학 교수였다. 인맥이 넓다는 교수들도 프랑스 쪽은 잘 모른다고 했다. 사전에 입수한 한 대학원 교수진의 출신 대학 목록을 보니 해외파 60명 가운데 58명이 미국 대학 출신이었다.

“요즘 임용되는 40대 교수 대부분은 미국에서 계량과 통계를 공부했어요. 이들은 한국 경제를 잘 모릅니다.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거꾸로 그리는 경우도 봤죠.” 국내 경제를 연구하면서 ‘달러당 원’이 아니라 ‘원당 달러’ 식으로 환산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연구하던 경제모델이 한국에 맞지 않을 때다. 기축통화가 없고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소규모 개방경제’가 한국의 현실이다. 외환보유액이나 가계부채의 적정기준에 대해 국내 경제학자들이 해답을 잘 못 내놓는 것도 그 탓이라고 했다.
젊은 교수들도 할 이야기는 많다. 평가제도가 엄격해지다 보니 논문 등재 횟수 같은 절대점수가 중요해졌다. 국내 대학에선 대부분 미국 톰슨로이터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 인용지수(SSCI)를 기준으로 삼는다. SSCI에는 1700여개의 학술지가 등록돼 있는데 국내 발행지는 10개 남짓이다.
연구자들은 국내 경제를 연구하면 SSCI에 등재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통계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가 낮아 연구결과가 과소평가받는다는 것이다. B교수는 “해외에선 아직 한국 통계를 1970~80년대 개발연대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SSCI 때문에 계량연구에 더 몰리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한 가지 사회현상을 연구해 자신만의 독창적 이론을 확립하면 좋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는 “통계를 통해 기존 이론을 검증하는 편이 결과를 얻기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초 한국경제학회 등이 개최한 ‘경제학 방법론의 평가와 대안’ 세미나에선 “SSCI도 민간기업이 만든 지수에 불과한데 너무 얽매이는 것 아니냐”는 자성론이 쏟아졌다. 하지만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다른 평가기준이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이들 경제학자의 고민은 더 근본적인 데 있다. 한 학회장은 “과거 원로 교수들은 한국 경제에 삐딱한 소리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정부 비판을 많이 했던 C교수는 동료에게 ‘조심하는 게 어떠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금융권의 인사나 감사 자리라도 받으려면 ‘그 사람 무난하지’라는 평판이 더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었다.
그는 “학문엔 일정 부분 재원이 필요하지만 갈수록 돈이 우선인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국내에서 통화정책 관련 학회를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그가 퀴즈를 냈다. 답은 ‘돈 나올 곳이 한국은행뿐이라서’. 난센스로만 듣기 어려웠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속보] 소방청, 비상계엄령 발령에 긴급대응태세 강화 지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속보] 경찰, 갑호비상 발령…전직원 출근 명령](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82960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