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가 내달 1일부터 서울 소격동 갤러리GMA(광주시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여는 초대전 ‘묻다’는 동아시아 문인화가들이 추구한 절제의 미학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 최연소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그의 작품은 동시대 작가로는 드물게 교과서에 12점이 실렸다.
조선시대 초상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업으로 유명한 김씨는 먹을 금처럼 아껴 쓰던 문인화가들의 사의(寫意) 정신을 그림 그리기의 기본으로 삼는다. 인물이나 대상의 본질을 묘사하면서 구차하게 재료로 눈을 어지럽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차적인 요소들을 덜어내고 묘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최대한의 여운을 남기려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점의 ‘법정 스님 진영’. 한 점은 작년에 제작한 것이고 다른 한 점은 최근 화룡점정한 최신작이다. 2012년 선보인 성철스님 초상화 제작 때도 그랬지만 작가가 직접 무소유의 삶을 산 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공양하며 내면의 요체를 파악한 끝에 얻은 작품이다. 그래서 마치 스님의 맑은 기운이 그대로 전해오는 듯하다. 사실적 재현을 중시하는 전통 초상화법을 따랐지만 먹을 아끼는 절제의 미학이 그림을 지배하고 있다.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를 단순한 필선으로 처리해 정신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그렇다.

그렇다고 작가가 문인화의 정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밤송이, 미꾸라지, 돼지머리, 쓰러진 의자, 허물처럼 벗어 놓은 가사처럼 구체적이고 소소한 일상적 오브제를 통해 본질을 통찰하고 허위에 찬 세상을 향해 메스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로로 긴 전통적 족자형에서 벗어나 화폭 형식의 다양화를 꾀한 점도 새롭다.
법정 스님은 평생 모든 것을 덜어내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다. 김씨의 회화도 그와 비슷하다. 부차적인 것을 덜어내고 최소한의 것으로 대상을 마주할 때 비로소 본질적 아름다움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본다.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형사(形寫)를 떠나 내면의 뜻을 그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작가는 “이번 전시는 그 답을 스님에게 그림으로 묻는 전시”라고 말한다. 전시 타이틀을 ‘묻다’라고 붙인 이유다. 6월8일까지. (02)725-0040
정석범 문화전문기자 sukbumj@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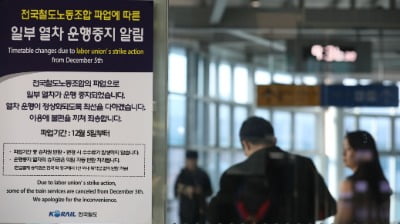
![[속보]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도 무정차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러브레터' 여주인공, 사망원인은 '히트쇼크'?…대체 뭐길래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3.1494477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