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보험사 등 대형기관
수익률 방어 위해 참여 늘어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들은 회수가 어려워 부실화된 대출자산을 털어 내기 위해 보통 분기마다 NPL 입찰을 연다. 매번 입찰 규모는 시중은행이 1000억원 안팎에 달하고, 저축은행도 100억원을 웃돈다.
입찰에 참여해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자산관리회사로는 선두주자 유암코를 비롯해 우리F&I, 파인트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입찰에서 은행 등이 내놓는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사 간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이 쏟아지며 시장이 태동할 때는 외국계 대형 금융회사들이 시장을 접수했지만 지금은 거의 철수했다. 빈자리는 이제 실력을 키운 국내사들로 채워졌다.
올 상반기 국내시장의 부실채권 입찰규모는 2조2843억원이다. 이 중 53.6%인 1조2244억원을 유암코가 가져갔다. △우리F&I 6610억원(28.94%) △파인트리 2953억원(12.93%) △신세이뱅크 1035억원(4.53%) 등이 뒤를 이었다.
NPL이 주목받으면서 연기금 보험 등 대형 기관투자가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다. 이들은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겨 NPL 전용 사모펀드를 만드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자산운용사 중에선 KB 마이애셋 유진 등이 NPL 펀드를 적극 운용 중이다.
최근엔 대부업체들도 부실채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오는 13일 있을 190억원 규모의 우리저축은행 NPL 입찰에는 15개사가 신청했는데 이 중 6~7곳이 대부회사다. NPL 시장 관계자는 “서너 달 전부터 대부업체들이 진입해 응찰자 수가 급증세”라며 “이들은 대부분 개인들로부터 NPL 시장 참여목적으로 돈을 모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NPL 투자의 성공사례만 보고 리스크를 등한시 해 무작정 대부업체에 돈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조정연 파인스트리트AMC 상무는 “해당 대부업체가 소송 채권회수 등의 전문적인 문제들을 잘 관리해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신영/하수정 기자 nyuso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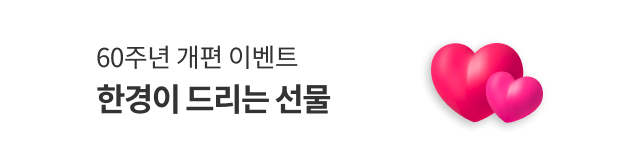






![[단독] "월 30만원씩 넣어요"…MZ 제치고 60대 우르르 몰린 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3388479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