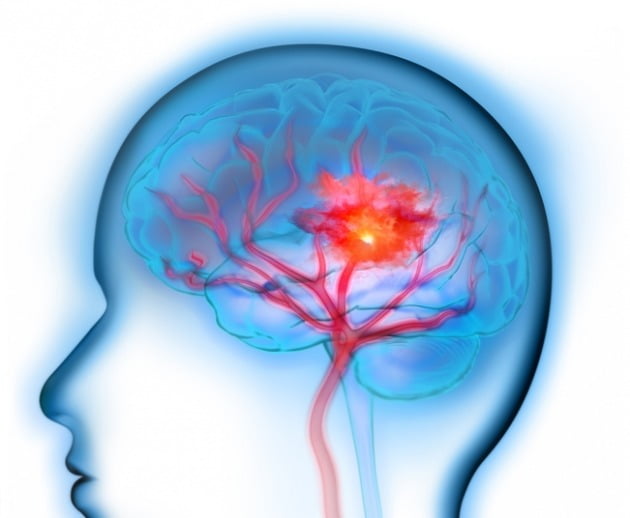본격적인 정비소가 나타난 때는 1915년이다. 전영선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고위급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리가 필요해지자 미국인 제임스 모리스가 자동차 판매점을 내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비사로 일하던 친구 하워드를 초빙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비공장이다. 이후 자동차가 점차 늘면서 정비 기술자를 양성하는 학원이 생겨났고, 고장나는 자동차가 많아 정비 기술자는 생계 걱정이 필요 없는 직업으로 인식됐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차 정비점을 차리기만 하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자동차 품질이 향상되면서 점차 고장이 줄었다. 반면 정비소는 계속 증가했고,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비 기술자도 크게 늘었다. 급기야 정비업계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 판매량은 그대로인데, 정비소만 확산되는 형국이다.
자동차 제조사의 프랜차이즈 정비소도 늘었다. 타이어, 정유사도 정비업에 뛰어들면서 무한경쟁 시장으로 변모했다. 결국 정비업계는 대기업의 정비업 진출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대기업 정비점 확대를 막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정비소를 위해 대기업 지정 협력점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때 들고 나온 취지가 사양길에 들어선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지원이다. 한마디로 정비업도 ‘동반성장’하겠다는 의지다.
동반성장 방법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지정 협력점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새로 도시가 들어서는 곳은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협력점을 개설하되 숫자는 2013년 5월 대비 2% 이내여야 한다. 완성차회사 한 곳이 1000여 곳의 정비 협력점을 운영한다면 신도시에만 추가로 개설하되 신규 서비스센터는 연간 20곳을 넘지 못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부터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이다. 수입차는 서비스센터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국을 그물처럼 연결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로 수입차 공세를 막아내려는 국산차 입장에선 공정한 경쟁 조건이 무너졌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완성차회사가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면서 고장률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마디로 성장 없이 경쟁만 치열한 분야가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비는 이제 단순한 수리를 넘어서야 한다. 고치고(repair), 교환(replace)하는 기본 역할 외에 새로운 무언가를 찾지 못하면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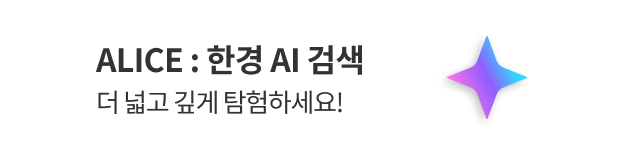
![[단독] 현대차 정의선의 파격…CEO 무뇨스 '외국인 첫 발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4826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