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이 돌아왔다"는 아베 선언에 주목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새로운 밀월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하는 자리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동맹의 신뢰와 강한 연대감이 완전히 부활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한다”고 말한 대목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신(아베) 재임 중 미국에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을 것이다”고 화답한 것은 양국이 이미 찰떡 공조의 관계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집권 후 잇단 극우 성향 언행을 보이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해 미국이 이처럼 화합의 맞장구를 친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 때문일 것이다. 당장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 일본만한 카드가 없었을 것이다. 핵실험 위협을 그치지 않는 북한을 다루는 데도 일본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일본 경기 회복이 급선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대담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일본 국민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근히 엔저를 용인한 것은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민감 품목 관세철폐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일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부분도 주목된다. 일본은 여기에 화답하는 발표를 이번 주에 내놓을 계획이다.
미·일의 급속한 접근은 한국에 복잡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안보동맹 강화는 대북 공조나 중국 관계에서 나쁠 게 없겠지만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경제 방면의 득실도 셈이 복잡하다. 엔저는 분명 한국에 불리한 요소다. 그러나 TPP는 복잡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다. 한·중 FTA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고 일본 등 TPP 참가국 시장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점이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돌아왔다”고 공언했다. 일본의 귀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직은 분명치 않지만 새로운 미·일 관계가 박근혜 정부에 하나의 도전적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집권 후 잇단 극우 성향 언행을 보이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해 미국이 이처럼 화합의 맞장구를 친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 때문일 것이다. 당장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 일본만한 카드가 없었을 것이다. 핵실험 위협을 그치지 않는 북한을 다루는 데도 일본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일본 경기 회복이 급선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대담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일본 국민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근히 엔저를 용인한 것은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민감 품목 관세철폐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일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부분도 주목된다. 일본은 여기에 화답하는 발표를 이번 주에 내놓을 계획이다.
미·일의 급속한 접근은 한국에 복잡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안보동맹 강화는 대북 공조나 중국 관계에서 나쁠 게 없겠지만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경제 방면의 득실도 셈이 복잡하다. 엔저는 분명 한국에 불리한 요소다. 그러나 TPP는 복잡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다. 한·중 FTA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고 일본 등 TPP 참가국 시장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점이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돌아왔다”고 공언했다. 일본의 귀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직은 분명치 않지만 새로운 미·일 관계가 박근혜 정부에 하나의 도전적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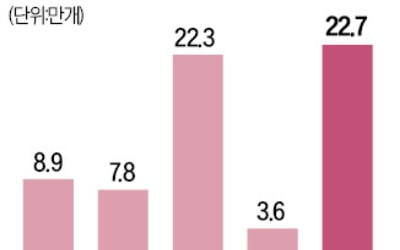
![[속보] 루마니아 헌재, '극우 승리' 대선 1차투표 무효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