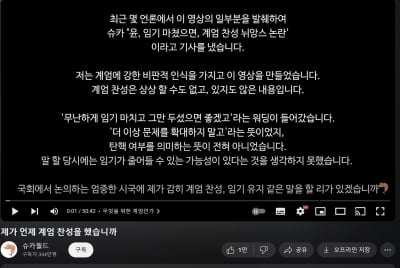루이비통 전용매장서만 판매…한국 남성 겨냥 마케팅 강화

스위스 바젤에서 최근 열린 세계 최대 시계·보석 박람회인 바젤월드에서 만난 함디 채티 루이비통 시계·보석 부문 대표(45·사진)는 거침이 없었다. 시계로만 따지면 이제 열 살밖에 안 된 ‘새내기’지만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자본력을 앞세워 100~200년 역사를 지닌 명품 시계 브랜드들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는 자신감에서였다. 그는 “루이비통에 10년은 (명품 시계로 도약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루이비통이 시계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점은 2002년. 파슬 타이맥스 등 전문 시계제조 업체에 ‘브랜드 이름’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시계를 내놓은 아르마니 보스 페라가모 등 대다수 명품 패션 브랜드와 달리, 루이비통은 직접 제조·판매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해 스위스 시계제조 공방 및 부품업체를 차례로 인수하고, 수십년 경력의 시계장인 등을 스카우트했다. 몽블랑 해리윈스턴 피아제 등에서 경력을 쌓은 채티 대표 역시 루이비통이 2010년 ‘모셔온’ 것이다.
채티 대표는 “루이비통 시계의 강점은 거의 모든 공정을 외부 전문업체에 발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이라며 “수많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 중 루이비통만큼 자체 제작 비중이 높은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루이비통은 전통의 시계 명가와 마찬가지로 디자인부터 핵심 부품인 무브먼트(동력장치) 제작, 부품 조립, 품질 검사까지 시계 제조 전 과정을 직접 컨트롤한다.

판매처를 기존 루이비통 부티크로 한정한 것도 특이하다. 까르띠에 등 대다수 명품 시계업체들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 단독 부티크 외에 여러 시계 브랜드를 함께 판매하는 편집매장에도 들어간다. 그는 “루이비통은 ‘다른 누구에게’ 고객들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며 “우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맞이해야 루이비통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명품 시계 시장에 대해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명품 시계 시장은 한층 더 커질 것”이라며 “명품 양복과 구두, 넥타이, 가방 등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아시아 남성들의 눈이 시계로 옮아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바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