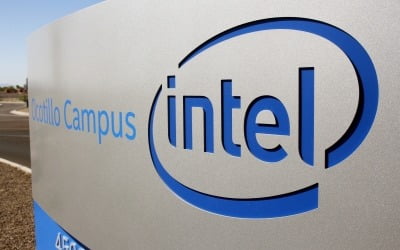영국이 미국 51번째 주가 된다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960년대 중반 영국 대중문화가 미국을 공습했다. 선두에는 비틀즈, 롤링 스톤즈, 더 후 등 걸출한 음악가들이 포진했다. 미국 젊은이들은 이 영국 뮤지션들의 달콤한 ‘브릿팝(British Pop)’에 열광했다. 곧 이어 옷 차림새부터 말투까지 ‘영국 따라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평론가들은 이 현상을 ‘영국의 침공(British Invasion)’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영국의 고유한 패션과 생활방식이 모두 미국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영국이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동안 영국 남성들은 깔끔한 정장을 선호했다. ‘영국 신사’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이유다. 그러나 요즘은 청바지에 셔츠, 운동화 차림이 대세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남성들을 모방한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성형수술도 유행이다. 미국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닮고 싶어하는 영국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영국 성형외과 의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성형수술이 3배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가슴 확대 수술과 남성의 가슴 축소 수술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식습관도 변했다. 영국식 레스토랑은 미국식 패스트푸드점으로 속속 탈바꿈하고 있다. 미국 치킨 업체 KFC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올 들어 매출액이 14% 가량 늘었다. 앞으로 5년간 200~300개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프로작’이라는 항우울제를 찾는 영국 사람들도 늘고 있다. 영국 정신과의사 단체 ‘마인드’의 알리슨 코브 박사는 “다른 항우울제를 제쳐두고 유독 ‘프로작’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은 미국 영화와 소설에 ‘프로작’을 복용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영국의 고유한 패션과 생활방식이 모두 미국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영국이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동안 영국 남성들은 깔끔한 정장을 선호했다. ‘영국 신사’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이유다. 그러나 요즘은 청바지에 셔츠, 운동화 차림이 대세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남성들을 모방한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성형수술도 유행이다. 미국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닮고 싶어하는 영국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영국 성형외과 의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성형수술이 3배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가슴 확대 수술과 남성의 가슴 축소 수술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식습관도 변했다. 영국식 레스토랑은 미국식 패스트푸드점으로 속속 탈바꿈하고 있다. 미국 치킨 업체 KFC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올 들어 매출액이 14% 가량 늘었다. 앞으로 5년간 200~300개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프로작’이라는 항우울제를 찾는 영국 사람들도 늘고 있다. 영국 정신과의사 단체 ‘마인드’의 알리슨 코브 박사는 “다른 항우울제를 제쳐두고 유독 ‘프로작’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은 미국 영화와 소설에 ‘프로작’을 복용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