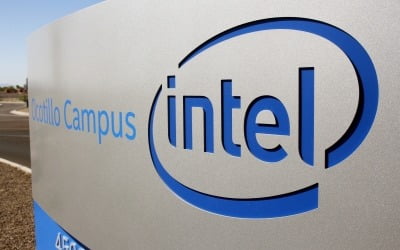"북한의 자살골" - AWSJ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편집자주] 지난 29일, 월드컵 기간 중 행해진 북한의 서해상 총격 사태와 그로 인한 사상으로 국민적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외신들도 다양한 충격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태를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의 7월 1일자 사설을 옮긴다.
북한의 호전적인 독재자 김정일은 북한의 현실과는 대조적인 남한의 번영이 주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월드컵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자살골을 넣는 방법은 알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는 지난 주말 서해상의 교전으로 남한의 군인들을 전사시킴으로써 서울과 워싱턴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목요일 미국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7월 중순 북한에 보내기로 제의했었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의 대북 유화정책을 거부한 이후 얼어붙었던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였다. 어떤 말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틀어버리는 데 능숙한 김정일은 지난 1월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며 지난 수개월간 방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유화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북한 해군이 한반도의 해상 경계를 넘어 습격하는 것을 용인했다. 지난 6개월간 북한의 도발이 지난해 연간회수보다 많았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 아침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호전적인 북한 군대는 분명히 잘 준배돼 있었다. 남한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제지를 당하자 곧 사격을 가했으며 4명의 전사자를 비롯해 20명이 다쳤으며 한명은 실종됐다.
북한의 침략은 예상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 여태까지는 우려 표명을 삼가고 있더라도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부의 이중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인된 뒤에도 켈리 차관보의 방북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월드컵 축구대회 폐막을 앞두고 가해진 이 같은 공격에 대해 남한의 첫 반응은 매우 강했다. 월드컵에서 자국의 팀이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룬 데서 오는 기쁨을 깬 북한에 대해 남한 시민들은 분노했다.
평양의 행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보여 왔던 김대중 대통령조차 북한에 대해 비난했다. 그러나 과거의 태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임성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즉각 남한 정부는 이 같은 사태로 '햇볕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햇볕정책은 김정일이 2년전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미 죽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햇볕정책의 유해를 남한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매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몇몇 전문가들은 햇볕정책이 지난 토요일에 일어난 사태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상선이 남한 해역을 침범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군으로 하여금 대응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유사한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다른 야만적인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확고한 제지뿐이다. 실패한 햇볕정책 같은 접근은 성과 없이 거듭된 양보를 부르고 불량배들의 요구만 커지게 만든다.
지난 4월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때로는 북한에 채찍을 가하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상 이 발언은 남북 경제회담의 취소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한측은 비겁하게도 최 장관의 발언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발언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최 장관이 불만을 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부시 정부에 들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거칠어지자 김정일은 필사적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지난 토요일 사태로 정점을 이룬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을 보아왔을 뿐이다.
남한 국민들이 햇볕정책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명됐다. 여론조사가 맞다면 올 12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현실에 입각해 지난 토요일 북한이 넣은 자살골을 햇볕정책 중단에 대한 핑계로 쓸 것인가, 아니면 햇볕정책을 고수해 다음 정권에서 이를 폐기하게 만들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