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국은 1972년 아난다 채크라바티와 스코트 켈로그에게 살아있는 유기체와 관련된 최초의 특허권을 부여했다.
이 특허권부여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결국 1980년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1991년에는 특허국이 4천건의 유전관련 특허권신청을 접수했고 1995년에는 신청건수가 무려 50만건에 달했다.
이에 당황한 특허당국은 그해 10월 특허권신청에 제약을 가했다.
휴먼게놈사이언스라는 단일 회사가 골다공증및 관절염치료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유전자를 포함해 1백6종의 완전한 인간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이미 확보했고 7천5백종도 더되는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해놓고 있다.
비단 유전자만이 아니라 하버드 생쥐와 같은 갖가지 동물들도 특허권대상이 되고 있다.
1998년3월까지 85종의 동물이 특허권을 받았고 90종이 심사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신속히 움직이지 않는 기업은 생명과학사업의 핵심분야로부터 배제되는 신세가 될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귀중한 지적자산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업관계와 제휴관계의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종래의 업종간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간 수천건의 새로운 화합물과 화합방식이 발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 업종의 회사가 다른 업종의 어떤 회사가 몇 십년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해결방식을 먼저 찾아내 특허까지 받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동시에 유전자 특허러시는 심각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과학연구와 그것이 갖다주는 파격적인 결과를 학계는 앞으로도 계속 공유하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해줄수 있는 발전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국한될 것인가.
가난한 나라들도 생명공학의 혜택에참여할수 있을 것인가.
농업관련 기업들은 이미 이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에는 종자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일반대중및 비영리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도 개량종을 이용해 수확을 높일수 있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유전공학적으로 처리된 종자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따르는 점을 감안할때 종자사업을 주름잡고 있는 농기업및 농화학 거대기업들이 특허권을 가진 기술의 공개를 꺼리게 될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과 프랑스의 농민들이 몬산토가 옥수수및 대두 종자의 시장지배를 꾀하고 있다며 독점금지법에 걸어 제소했다.
노바티스 듀폰을 비롯한 다른 7개업체도 모의가담자로 지목됐다.
생명공학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리=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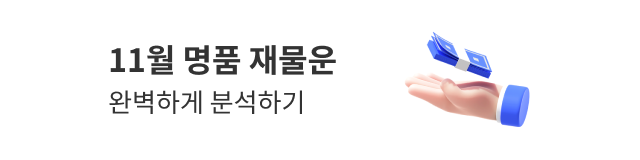


![[단독]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10조 사업' 날린 이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92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