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제정이 물 건너간 것 같다.
적어도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제정은 불가능해진
것이 틀림없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던 이 법안에 집권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한 당직자도 "법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 법보다 의지"라고 지적했던 우리는 당정협의에서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 때 특별법안의 이같은 운명을
어느 정도 예견했었다.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대의를 좇는 것보다는 정치나 경제 또는 사회 여건에
따라 집권당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제약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언적 효력만 지니는 법을 만들어놓고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는
의지만 과시하려 했다가 정치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보고 아예 법 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때문에 실망도 크다.
법제정을 둘러싼 이런 해프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서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당장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도 내년의 추경편성을 기정 사실로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벌어질 경우 국가채무
감축이라는 당면과제의 추진도 공염불로 끝나기 십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올 연말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3%인 1백11조5천억원에 달한다.
젖먹이까지 포함해 국민 1인당 2백36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천만원
에 이른다.
이밖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액도 94조원을 넘는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기로 한 것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아직은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였다.
지금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국가채무가 줄어든 것은
더더욱 아니다.
특별법안에서 대규모 재해라든가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동, 실업상황의 악화,
서민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4가지 사례로 제한한 추경예산 편성요건도
따져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편성이 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집권당이 이런 형식적 법률마저 포기한다면 별도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이라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까지 나라 빚을 걱정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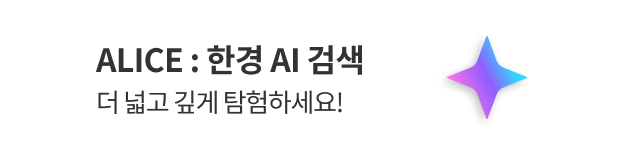
![[조일훈 칼럼] '기업 관료주의' 연못에 날아든 현대차 인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5383340.3.jpg)
![[특파원 칼럼] 트럼프 앞에서 공동 운명체된 韓·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6564071.3.jpg)
![[취재수첩] 판결 불리하다고 법치 기반 허무는 민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3695061.3.jpg)

![[단독]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10조 사업' 날린 이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92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