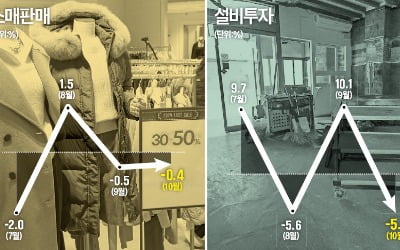[은행 지배시대] (3) ''당근'도 필요하다' .. '동반자' 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8월22일.
은행감독원은 서울 외환 신한 대구 산업은행에 강제로 8개 주거래기업을
떠맡겼다.
은행들이 주거래를 않겠다고 서로 버텨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주거래 강제배분은 국내은행사상 처음있는 일.
은행들이 주거래를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기업들의 경영이 나빠질 때 골치아픈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긴급대도 일으켜 줘야 한다.
실제 8개 기업중 수산중공업 나산 보성 등 세개기업은 결국 화의를 신청
했다.
은행과 기업의 "멀고도 가까운 사이"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이처럼 언제나 비틀려 왔다.
신뢰는 찾아볼 수 없다.
공생의 철학도 없다.
은행은 기업에 무너질테면 무너지라는 식이다.
기업은 우리가 무너지면 은행도 함께 망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악순환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가 불거질 무렵 최고조에 달했다.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이처럼 무너진 은행과 기업의 관계를 복원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로 볼수 있다.
주거래은행제도는 지난 76년 도입됐다.
주거래은행을 지정해 종합적인 여신관리를 하려는 시도였다.
지난 20여년동안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물론 금융환경이 바뀌면서 다소 변질되기도 했다.
금융시장이 셀러스마켓(공급자시장)에서 바이어스마켓(수요자시장)으로
바뀐게 가장 두드러진 변화였다.
그 결과 주거래은행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주거래은행의 입김도 약해졌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몰아닥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기업과 은행이 함께 쓰러질 위기가 닥치자 은행에게 다시 채찍이 주어진
것이다.
재무약정을 맺고 나면 기업은 은행의 통제를 받을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운전자금을 쓸때도, 부동산을 팔때도 주거래은행 눈치를 살펴야
한다.
때론 거부당할지 모른다.
시어머니도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은행의 기업지배가 성공하려면 기업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은행과 기업의 관계는 복원될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중단이란 채찍만 들고 있다.
애당초 성공하기란 어렵게 돼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채찍과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장치가 부족
했다는 얘기다.
무조건 몰아치기보다 자구책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들도 곁들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혹독한 상황에선 당근이 더욱 필요한지 모른다.
사실 재무약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기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기업을 파산상태로 봐야 한다. 채권자들 합의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모든걸 공개해야 한다. 그런 다음 CP를 장기자금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김병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는 지적도 이를 반증한다.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독일 일본의 은행-기업 관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독일의 하우스뱅크(주거래은행)는 거래기업의 지분을 갖고 적극 개입한다.
그렇다고 귀찮게 간섭하는게 아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게 무언지 찾아서 도와준다.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기도 한다.
한마디로 기업은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에만 주력하라는 얘기다.
외풍은 은행이 막아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거래은행은 기업의 협력자로서 존재한다.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는다.
기업의 이윤율이 떨어질땐 금리를 낮추어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준다.
반대로 이윤율이 높아지면 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상환토록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물론 은행이 대출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기업들에겐 꿈같은 얘기다.
은행과 기업의 관계는 정부가 강제하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상관습과 기업문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오랜 세월속에 관행으로 굳어져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날 갑자기 은행에 채찍을 들려준다고 해서 은행과 기업이 건전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채찍과 함께 당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
은행감독원은 서울 외환 신한 대구 산업은행에 강제로 8개 주거래기업을
떠맡겼다.
은행들이 주거래를 않겠다고 서로 버텨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주거래 강제배분은 국내은행사상 처음있는 일.
은행들이 주거래를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기업들의 경영이 나빠질 때 골치아픈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긴급대도 일으켜 줘야 한다.
실제 8개 기업중 수산중공업 나산 보성 등 세개기업은 결국 화의를 신청
했다.
은행과 기업의 "멀고도 가까운 사이"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이처럼 언제나 비틀려 왔다.
신뢰는 찾아볼 수 없다.
공생의 철학도 없다.
은행은 기업에 무너질테면 무너지라는 식이다.
기업은 우리가 무너지면 은행도 함께 망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악순환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가 불거질 무렵 최고조에 달했다.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이처럼 무너진 은행과 기업의 관계를 복원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로 볼수 있다.
주거래은행제도는 지난 76년 도입됐다.
주거래은행을 지정해 종합적인 여신관리를 하려는 시도였다.
지난 20여년동안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물론 금융환경이 바뀌면서 다소 변질되기도 했다.
금융시장이 셀러스마켓(공급자시장)에서 바이어스마켓(수요자시장)으로
바뀐게 가장 두드러진 변화였다.
그 결과 주거래은행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주거래은행의 입김도 약해졌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몰아닥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기업과 은행이 함께 쓰러질 위기가 닥치자 은행에게 다시 채찍이 주어진
것이다.
재무약정을 맺고 나면 기업은 은행의 통제를 받을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운전자금을 쓸때도, 부동산을 팔때도 주거래은행 눈치를 살펴야
한다.
때론 거부당할지 모른다.
시어머니도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은행의 기업지배가 성공하려면 기업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은행과 기업의 관계는 복원될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중단이란 채찍만 들고 있다.
애당초 성공하기란 어렵게 돼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채찍과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장치가 부족
했다는 얘기다.
무조건 몰아치기보다 자구책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들도 곁들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혹독한 상황에선 당근이 더욱 필요한지 모른다.
사실 재무약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기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기업을 파산상태로 봐야 한다. 채권자들 합의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모든걸 공개해야 한다. 그런 다음 CP를 장기자금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김병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는 지적도 이를 반증한다.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독일 일본의 은행-기업 관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독일의 하우스뱅크(주거래은행)는 거래기업의 지분을 갖고 적극 개입한다.
그렇다고 귀찮게 간섭하는게 아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게 무언지 찾아서 도와준다.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기도 한다.
한마디로 기업은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에만 주력하라는 얘기다.
외풍은 은행이 막아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거래은행은 기업의 협력자로서 존재한다.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는다.
기업의 이윤율이 떨어질땐 금리를 낮추어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준다.
반대로 이윤율이 높아지면 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상환토록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물론 은행이 대출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기업들에겐 꿈같은 얘기다.
은행과 기업의 관계는 정부가 강제하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상관습과 기업문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오랜 세월속에 관행으로 굳어져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날 갑자기 은행에 채찍을 들려준다고 해서 은행과 기업이 건전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채찍과 함께 당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