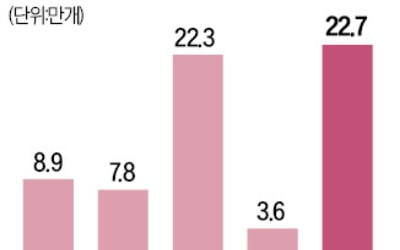[취재여록] 영국 재무장관의 망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런던 외환시장은 요즘 재무장관이 당한 "망신"을 놓고 화제다.
발단은 지난 1일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노동당 정권의 경제 정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
그 이튿날부터 파운드화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장중 한 때 서유럽
기축통화인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6년만의 최고치인 파운드당 2.96마르크로
까지 치솟았다.
브라운장관의 "망신"은 이 대목에서 시작됐다.
"아무도 파운드화의 초강세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위성 발언을 함으로써
"진화"를 시도했던 것.
그러나 외환시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파운드화는 이날 장중 수준에 못미치는 2.94마르크에 마감됐지만 그
다음날에는 다시 2.96마르크로 되올랐다.
재무장관의 발언이 외환시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예전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무장관이 금리 등 주요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장관의 "말씀"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재무장관은 노동당 정부의 감독체계 일원화 작업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쥐게 된 증권감독위원회(SIB)
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은 최근 물가감독권이 중앙은행으로 이양돼면서
딴판으로 달라졌다.
영란은행의 "독립"으로 금리결정권은 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행사하게
됐다.
재무장관이 갑자기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 또다른 이유는
너무 정치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데도 2일 발표된 경제정책은 "긴축적"
이지 못하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리의 금융개혁 방향중 감독체계는 부분적으로 영국에서 따온 것이다.
감독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덮어두더라도 우리의 금융 시장이 재경원장관
발언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통화정책에 관한 한 개혁이 제대로
돼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 런던 = 이성구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
발단은 지난 1일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노동당 정권의 경제 정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
그 이튿날부터 파운드화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장중 한 때 서유럽
기축통화인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6년만의 최고치인 파운드당 2.96마르크로
까지 치솟았다.
브라운장관의 "망신"은 이 대목에서 시작됐다.
"아무도 파운드화의 초강세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위성 발언을 함으로써
"진화"를 시도했던 것.
그러나 외환시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파운드화는 이날 장중 수준에 못미치는 2.94마르크에 마감됐지만 그
다음날에는 다시 2.96마르크로 되올랐다.
재무장관의 발언이 외환시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예전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무장관이 금리 등 주요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장관의 "말씀"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재무장관은 노동당 정부의 감독체계 일원화 작업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쥐게 된 증권감독위원회(SIB)
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은 최근 물가감독권이 중앙은행으로 이양돼면서
딴판으로 달라졌다.
영란은행의 "독립"으로 금리결정권은 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행사하게
됐다.
재무장관이 갑자기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 또다른 이유는
너무 정치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데도 2일 발표된 경제정책은 "긴축적"
이지 못하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리의 금융개혁 방향중 감독체계는 부분적으로 영국에서 따온 것이다.
감독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덮어두더라도 우리의 금융 시장이 재경원장관
발언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통화정책에 관한 한 개혁이 제대로
돼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 런던 = 이성구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