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성공했다] 최병철 <극동전선 사장>..케이블전문회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극동전선의 최병철(51)사장은 지금도 80년대 후반의 그 일을 잊을
수 없다.
당시 극동전선은 대우조선으로부터 선박용고무케이블을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측이 요구한 케이블의 조건은 무독 무연 난연 내화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당시 극동전선으로서는 생산이 불가능에 가까운
첨단제품이었다.
극동이 생산을 못할 경우 외국의 업체로 주문이 넘어갈 판이었다.
최사장은 결단을 내렸다.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 앉고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당장 자신은 없었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오기에 가까운 뚝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표이사 회장인 이형종 회장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책임지고
생산을 해내겠다고 덜컥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다.
주어진 기간은 2개월.
만약 납기를 어길시에는 선박을 발주한 외국의 선주측에 극동전선이
하루에 2만달러를 위약금으로 배상키로 하는 불리한 조건까지 떠안았다.
이때부터 회사는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최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밤낮없이
매달렸다.
이회장도 전선 선진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등 선진국을
수도 없이 왔다갔다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끝에 극동은 마침내 선주측이 요구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 데 성공했다.
영국의 로이드사로부터 품질인증도 획득했다.
이후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극동측에 제품생산을 일임하게 됐다.
"이때부터 비록 중견기업이지만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직원들 사이에 확산됐습니다"
극동은 현재 선박용케이블에 관한한 국내에선 독보적인 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월 생산량만도 2백만 로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최사장의 설명이다.
지난 90년대 초엔 국내 최초로 저독성 난연절연 케이블을 개발해
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선박용고무케이블과 불에 타지 않는 케이블분야에선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일류업체가 되는 것이 최사장의 목표다.
"광케이블이나 초고압케이블 같은 분야는 솔직히 우리같은 중견기업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측면이 많아요.
조금 전망있어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는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이러한 틈새시장을 꾸준히 공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극동은 경기도 구리.하남권을 권역으로 한 2차케이블 사업자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다각화와 함께 회사이미지제고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금도 극동전선이 극동건설의 계열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품에는 큰 하자가 없지만 이름없는 회사엔 주문을 할 수 없다는
주문자들이 지금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최사장은 이름없는 회사에
제품을 맡길 수 없다는 바이어를 설득하기 위해 홀로 홍콩으로 날아가
사흘간 호텔문을 두드려 "일단 한번만 우리 공장과 제품의 수준을
봐달라"고 설득해 한 외국바이어를 공장으로 초청한 일이 있다.
그러나 바이어는 초라한 극동의 공장모습에 발길을 돌리려 했다.
이때 최사장은 짧은 실력이지만 "뚝배기보다 장맛"(You cannot judge
a book by its color)이란 우리 속담을 영어로 설명하는 기지를 발휘, 결국
설득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
수 없다.
당시 극동전선은 대우조선으로부터 선박용고무케이블을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측이 요구한 케이블의 조건은 무독 무연 난연 내화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당시 극동전선으로서는 생산이 불가능에 가까운
첨단제품이었다.
극동이 생산을 못할 경우 외국의 업체로 주문이 넘어갈 판이었다.
최사장은 결단을 내렸다.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 앉고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당장 자신은 없었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오기에 가까운 뚝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표이사 회장인 이형종 회장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책임지고
생산을 해내겠다고 덜컥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다.
주어진 기간은 2개월.
만약 납기를 어길시에는 선박을 발주한 외국의 선주측에 극동전선이
하루에 2만달러를 위약금으로 배상키로 하는 불리한 조건까지 떠안았다.
이때부터 회사는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최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밤낮없이
매달렸다.
이회장도 전선 선진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등 선진국을
수도 없이 왔다갔다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끝에 극동은 마침내 선주측이 요구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 데 성공했다.
영국의 로이드사로부터 품질인증도 획득했다.
이후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극동측에 제품생산을 일임하게 됐다.
"이때부터 비록 중견기업이지만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직원들 사이에 확산됐습니다"
극동은 현재 선박용케이블에 관한한 국내에선 독보적인 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월 생산량만도 2백만 로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최사장의 설명이다.
지난 90년대 초엔 국내 최초로 저독성 난연절연 케이블을 개발해
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선박용고무케이블과 불에 타지 않는 케이블분야에선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일류업체가 되는 것이 최사장의 목표다.
"광케이블이나 초고압케이블 같은 분야는 솔직히 우리같은 중견기업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측면이 많아요.
조금 전망있어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는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이러한 틈새시장을 꾸준히 공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극동은 경기도 구리.하남권을 권역으로 한 2차케이블 사업자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다각화와 함께 회사이미지제고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금도 극동전선이 극동건설의 계열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품에는 큰 하자가 없지만 이름없는 회사엔 주문을 할 수 없다는
주문자들이 지금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최사장은 이름없는 회사에
제품을 맡길 수 없다는 바이어를 설득하기 위해 홀로 홍콩으로 날아가
사흘간 호텔문을 두드려 "일단 한번만 우리 공장과 제품의 수준을
봐달라"고 설득해 한 외국바이어를 공장으로 초청한 일이 있다.
그러나 바이어는 초라한 극동의 공장모습에 발길을 돌리려 했다.
이때 최사장은 짧은 실력이지만 "뚝배기보다 장맛"(You cannot judge
a book by its color)이란 우리 속담을 영어로 설명하는 기지를 발휘, 결국
설득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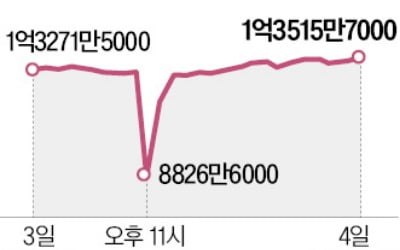

!['올해의 VC'는 SBVA, 스틱벤처스…'코리아 VC 어워드' 성료 [Geeks' Briefing]](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4099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