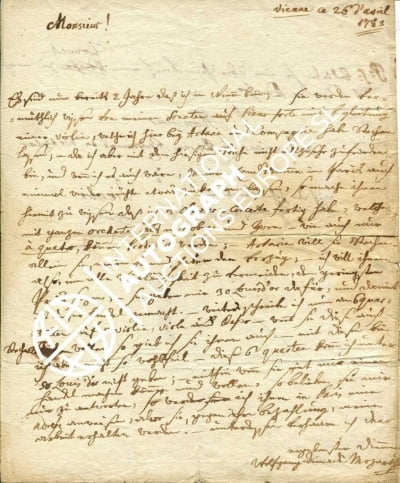못한채 쓸쓸히 막을 내렸다.
"하원 4선" "상원 3선" "상원 여당 원내총무" "타협의 명수"등 화려한
수식어뒤에 펼쳐진 그의 정치역정은 "그림자인생"이었다.
캔자스주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지난 61년 하원의원에 선출되면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한다.
8년뒤인 69년 상원에 당선될때까지만 해도 돌의 앞길은 장밋빛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중진으로 성장한 70년대 중반부터 그의 정치인생은 제목소리
잃은 "공화당의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
74년 워터게이트사건이 터졌을때 돌후보는 침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닉슨호에 몸을 실어야 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란 당시 직함 탓에 닉슨의 방패막이노릇은 그의
몫이었다.
80년 야망의 첫 대권 도전도 실패였다.
그 이듬해에는자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을 도와 감세정책
신봉자로 나섰다.
와신상담끝에 88년 대권재수에 도전했지만 부시에게 참패했다.
2년뒤 부시의 세금인상안 맹신자로 돌변했던 것은 차라리 치욕이었다.
소수당리더라는 책임감에눌린 불명예 타협이었다.
94년 다시 상원에 출마했을땐 모든 조명이 동료인 뉴트 깅리치에게
쏟아졌다.
또한번 깅리치의 의견에 동조해야 하는 그의 마음은 쓸쓸했다.
평생을 바쳤던 공화당도 돌에게는 오히려 적이었다.
"견제"의 균형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의 정서에 비춰볼때 공화당 선량후보들
의 희망사항은 돌이 아닌 클린턴의 승리였다.
민주당 대통령이 전제돼야 의회는 공화당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고희를 넘은 73세의 돌에게는 이제 은퇴만이 남았다.
평생을 "주인공을 빛내주는 조역"으로 보낸채 그는 20세기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