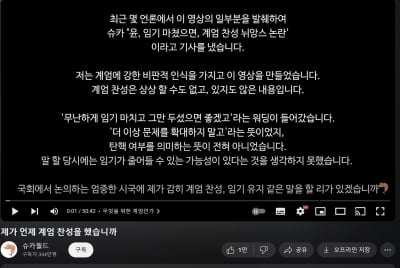[철강산업] 새로운 철강제품 진출 잇달아..'최고 올라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철강업체들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사업영역을 넘어 새로운 분야로 잇달아
진출하고 있다.
우선 한보철강이 아산만에 박슬래브공장을 지어 철근메이커에서 판재류
업체로 탈바꿈한 것을 비롯해 현대강관 부산파이프등 강관메이커들도
냉연및 컬러강판 설비도입을 결정했다.
이중 현대강관은 이미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동부제강은 기존의 냉연위주에서 벗어나 스테인리스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과 함께 쇳물을 직접 생산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며 인천제철은
스테인리스분야를 한층 더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국제강 역시 형강과 후판설비를 늘려 탈철근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고로업체인 포철은 광양제철소에 박슬래브를 건설, 전기로분야
에 새로이 진출키로 하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간 묵시적으로 지켜져 왔던 "1고로.3냉연.5전기로.5강관"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국내철강업체들은 고로는 포철, 냉연은 포철 동부제강 연합철강,
전기로는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 한국철강 한보철강, 강관은
부산파이프 현대강관 연합철강 동부제강 한국강관등으로 각사가 자신의
영역을 지켜 왔다.
설령 설비를 늘린다해도 그 영역내에서의 확장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이같은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보가 대변신을 추진한게 시발이나 이제는 영역구분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철강업체들이 신규분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철강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종전체제로는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늦출 경우 어떠한 상황에 부딪칠 수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해말
발생한 한국강관의 부도사태가 잘 입증해 준다.
왜냐하면 한국강관의 부도는 제품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다른 강관메이커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대구경강관쪽으로 중심이동을 한데
비해 한국강관은 PVC 동관등 대체재가 많고 중소업체들이 속속 밀고들어온
소구경에 계속 매달려 채산성이 떨어져 결국 부도로 이어진 것으로 당시
업계는 분석했다.
게다가 중국등 후발업체들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이 아직은 철강수입국이나 임금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서
강관이나 철근처럼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에서는 멀지않아
강력한 경쟁상대로 등장할게 분명하다.
철근의 경우엔 엄청난 수송거리에도 불구하고 터키산이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으로도 어느정도 한계에 왔다는 지적이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전에없이 과감하게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고부가가치품으로 중심을 옮기지 않고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채산성을
갖출 수도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의 철강산업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있다.
구조조정은 비단 영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제품의 세일스믹스, 다시말해서 제품구조도 그 대상이다.
한예로 철강업체들은 소구경생산을 줄여 대구경이나 중구경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함께 소구경의 고부가가치화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소구경 생산을 줄임과 동시에 소구경도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후육관(관의
두께가 두꺼운 제품)쪽으로 특화하고 있는게 대표적 사례다.
또 수요구조와 생산구조의 불균형도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냉연설비를 열연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철근과
형강은 넘치는데 비해 아연도강판은 모자라는 것등이 그 예다.
제품이나 설비측면 말고 조직이 비대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의 철강업체들은 설비축소와 인력절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최근 5년여동안 실시했다.
이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해가고 있는 것도 그 결과다.
국내업체들은 어떤가.
성장가도를 달려오다보니 슬림화보다는 오히려 거대화에 치중한 느낌이다.
이제서야 슬림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정도다.
앞으로는 조직의 슬림화가 사업의 구조조정 못지 않게 국내철강업체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현재와 같이 1인당 생산성에서 일본이나 미국에 뒤지고는 경쟁력을 유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철강업체들의 세계최고가 되어 그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점을 두어야할 과제로 지적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
진출하고 있다.
우선 한보철강이 아산만에 박슬래브공장을 지어 철근메이커에서 판재류
업체로 탈바꿈한 것을 비롯해 현대강관 부산파이프등 강관메이커들도
냉연및 컬러강판 설비도입을 결정했다.
이중 현대강관은 이미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동부제강은 기존의 냉연위주에서 벗어나 스테인리스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과 함께 쇳물을 직접 생산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며 인천제철은
스테인리스분야를 한층 더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국제강 역시 형강과 후판설비를 늘려 탈철근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고로업체인 포철은 광양제철소에 박슬래브를 건설, 전기로분야
에 새로이 진출키로 하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간 묵시적으로 지켜져 왔던 "1고로.3냉연.5전기로.5강관"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국내철강업체들은 고로는 포철, 냉연은 포철 동부제강 연합철강,
전기로는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 한국철강 한보철강, 강관은
부산파이프 현대강관 연합철강 동부제강 한국강관등으로 각사가 자신의
영역을 지켜 왔다.
설령 설비를 늘린다해도 그 영역내에서의 확장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이같은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보가 대변신을 추진한게 시발이나 이제는 영역구분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철강업체들이 신규분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철강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종전체제로는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늦출 경우 어떠한 상황에 부딪칠 수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해말
발생한 한국강관의 부도사태가 잘 입증해 준다.
왜냐하면 한국강관의 부도는 제품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다른 강관메이커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대구경강관쪽으로 중심이동을 한데
비해 한국강관은 PVC 동관등 대체재가 많고 중소업체들이 속속 밀고들어온
소구경에 계속 매달려 채산성이 떨어져 결국 부도로 이어진 것으로 당시
업계는 분석했다.
게다가 중국등 후발업체들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이 아직은 철강수입국이나 임금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서
강관이나 철근처럼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에서는 멀지않아
강력한 경쟁상대로 등장할게 분명하다.
철근의 경우엔 엄청난 수송거리에도 불구하고 터키산이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으로도 어느정도 한계에 왔다는 지적이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전에없이 과감하게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고부가가치품으로 중심을 옮기지 않고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채산성을
갖출 수도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의 철강산업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있다.
구조조정은 비단 영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제품의 세일스믹스, 다시말해서 제품구조도 그 대상이다.
한예로 철강업체들은 소구경생산을 줄여 대구경이나 중구경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함께 소구경의 고부가가치화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소구경 생산을 줄임과 동시에 소구경도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후육관(관의
두께가 두꺼운 제품)쪽으로 특화하고 있는게 대표적 사례다.
또 수요구조와 생산구조의 불균형도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냉연설비를 열연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철근과
형강은 넘치는데 비해 아연도강판은 모자라는 것등이 그 예다.
제품이나 설비측면 말고 조직이 비대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의 철강업체들은 설비축소와 인력절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최근 5년여동안 실시했다.
이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해가고 있는 것도 그 결과다.
국내업체들은 어떤가.
성장가도를 달려오다보니 슬림화보다는 오히려 거대화에 치중한 느낌이다.
이제서야 슬림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정도다.
앞으로는 조직의 슬림화가 사업의 구조조정 못지 않게 국내철강업체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현재와 같이 1인당 생산성에서 일본이나 미국에 뒤지고는 경쟁력을 유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철강업체들의 세계최고가 되어 그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점을 두어야할 과제로 지적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