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학종 불신'에도 SKY는 '학종 삼매경'
고대 논술전형 폐지, 학종 대폭 확대
연대는 학생부교과 대신 학종면접형 도입

학종은 성적순 줄 세우기를 지양하는 입학전형이다.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잠재력을 종합 평가한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자는 취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성평가가 이뤄진다. 정부의 학생부 위주 전형 확대 방침에 발맞춰 학종 선발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위주 정시나 교과 성적 위주인 학생부교과전형 입지가 줄어든다. 정부는 논술·특기자전형 폐지도 추진키로 해 결과적으로 남는 선택지는, 학종이다.
학종에 대한 비판은 만만찮다. ‘깜깜이 전형’ 지적이 대표적이다. 당락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수저 전형’이란 꼬리표도 따라붙었다. 학종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준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자 아들의 사례는 이 같은 ‘학종 불신’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대학은 ‘학종 삼매경’이다. 28일 이들 대학에 따르면 올해 입시에서도 서울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80%에 육박하는 수시를 학종으로 선발한다. 고려대는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학종을 대폭 강화했다. 연세대도 기존 학생부교과전형 대신 ‘학생부종합 면접형’을 신설했다.
학종의 긍정적 취지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학종 논란을 과도기에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안현기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학종의 최대 장점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있다”고 평했다. 고교 생활의 ‘누적된 답안지’인 학생부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결합해 입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수능 같은 정량평가로는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응빈 연세대 입학처장도 “학종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다양한 모습을 대학이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의미의 전형”이라며 “학종이 정착되면 진정한 고교 현장에서의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찬우 고려대 인재발굴처장 역시 “사교육 영향은 수능이 더 크다. 합격자 분석을 해보면 수능은 서울·특목고 출신이 많고 되레 학생부전형의 지방·일반고 출신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학생부의 신뢰성’이다. 학종은 학생부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지원자를 평가한다. 대학이 제한된 면접 시간 안에 학생부 기재 내용의 진위를 비롯한 과장·누락 여부를 가려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걸러낼 방법이 마땅찮다”고 짚었다.
학생부 신뢰성이 흔들리는 데 대해선 대학들도 우려했다. 단 학종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출제 오류가 있다고 해서 수능을 폐지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양찬우 처장은 “예컨대 학생부 기재를 현행처럼 ‘결과’만 쓸지, ‘과정’까지 쓸지 원칙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정성평가 성격으로 인한 불신이 큰 만큼 정량평가 요소를 가미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원래 학종 취지와는 맞지 않으나 학생부 교과 성적 비중을 높이는 등의 절충책도 생각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학종 불신은 곧 ‘교사에 대한 불신’이다. 조효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담임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학생부가 달라지는 ‘복불복’ 우려가 높다”면서 “담임이 학생부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학생부 각 과목 관련 기재에 담당 교과 교사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겁나서 휴대폰 못 만지겠어요"…3000만원 날리고 '경악'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065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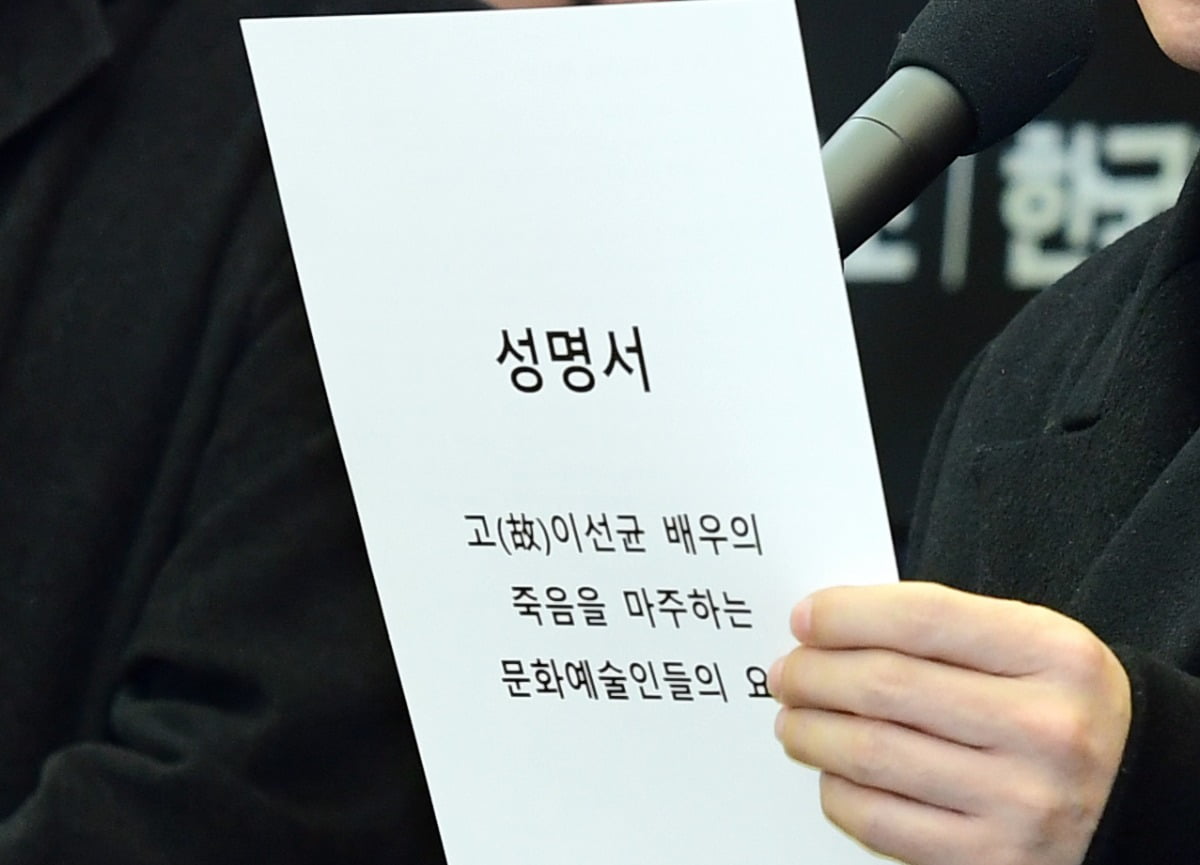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