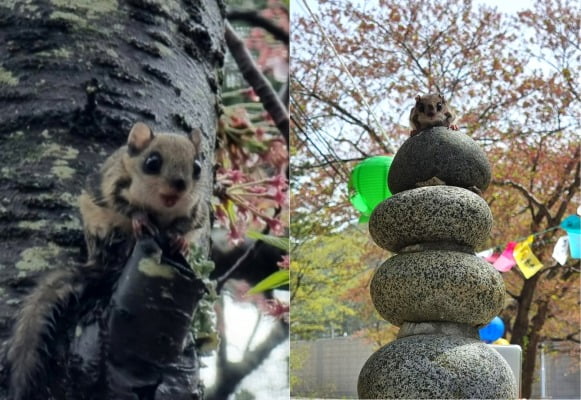[한경미디어 뉴스룸-한경닷컴] 그들은 왜 '폰팔이'로 불려야 했나
"소비자가 먼저 불법 원하기도"

2011년 스마트폰 붐이 일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극에 달했다. 이때 등장한 게 폰팔이다. 이통사들은 판매점에 가입자 한 명당 50만원 이상의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면서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때부터 가입자 모집에 혈안이 된 판매점들은 소비자를 속이기 시작했다. 공짜폰이라는 거짓 미끼가 대표적인 행태였다. 이후 소비자 뇌리엔 ‘폰팔이는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박혔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했다. 이후 악행을 저지르는 판매점은 많이 줄었지만 폰팔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예전 그대로다. 이 때문에 나름 양심적인 판매점까지 폰팔이로 매도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통신비 인하정책이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판매원의 어려움은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8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도 마찬가지였다. 중고폰을 찾는 외국인이 간간이 눈에 띌 뿐 한가한 모습이었다. 휴대폰 판매 경력 14년째인 A씨는 “주말이고 평일이고 손님이 거의 없다”며 “아직 악의적인 영업점이 있지만 양심적으로 소비자를 대하는 판매점도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판매점은 무조건 싸야 한다는 선입견도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A씨는 “소비자는 우리가 합법적인 판매보다 더 싸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는 법정상한선 이상의 지원, 즉 불법을 기대하는 게 보통”이라고 토로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리베이트 액수도 문제다. 다른 판매점의 B씨는 손님과 계약한 뒤 리베이트 액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경우다. “장사가 안돼 리베이트를 포기하면서까지 판매한건데 세금 10%까지 내고 나니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장사였다”고 말했다.
폰팔이로 불리는 판매점은 대부분 영세상인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 유통 종사자는 20만 명, 점포 수는 3만7000개에 달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롯데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에서도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종사자는 6만 명, 점포 수는 2만여 개로 쪼그라들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