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성공 조건은…"부총리에 경제정책 전권 줘야…경제수석은 앞에 나서면 안돼"
지위는 총리>부총리>경제수석…정책 실제권한은 수석이 가장 커
"대통령 신임 못 받는 부총리, 다른 장관들이 우습게 볼 것"
"예산권 없어도 인사권 주면 각부처에서 부총리 의견 경청"


김 교수는 “성공한 부총리는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과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경제정책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실린 역대 경제부총리들의 제언을 세 가지 테마로 정리했다.
예산권·직함보다 ‘대통령의 신임’ 중요
경제부총리가 갖는 힘의 원천으로 흔히 부총리 직함, 인사권, 예산권 등이 거론된다. 역대 부총리들은 예산권과 인사권, 부총리 직함이 갖는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일부는 부총리가 지닌 힘의 절반 이상은 예산권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A씨는 “그나마 국회의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예산권”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B씨는 “예산권이 없는 부총리는 타 부처 장관들이 무시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부처 간 조정능력 측면에서 부총리 직함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을 맡다가 부총리직제 부활로 경제부총리로 승격된 C씨는 “부총리 직책을 갖고서야 경제장관회의 등이 비로소 원활히 작동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대다수 경제수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부총리가 가장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D씨(김영삼 정부 재무부 장관)는 “만약 부총리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실세 장관들이 우습게 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신임은 부총리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했다. A씨는 “때론 대통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록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 나와도 열정적으로 토론을 즐겼다”고 회상했다.
인사권을 부여받은 부총리라면 예산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 A씨는 “부총리에게 예산권이 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각 부처 1급 이상을 인사할 때 부총리 의견을 듣는 것을 일상화했다”며 “이렇게 하니 각 부처 차관 등 핵심 인사들이 부총리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총리와 권한 나누기 바람직하지 않아”
부총리는 국무총리와 정책조정 역할과 범위 등을 놓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지위는 물론 총리가 부총리에게 앞선다. 정부조직법 19조에도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역대 경제부총리들은 경제정책에서만큼은 총리에 우선했고,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한다. 총리는 중요 경제 현안을 다루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서별관회의 등의 멤버도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E씨는 “비경제부처와 경제부처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라든지 규제 개혁, 당정 협의 등은 총리와 같이 풀어나가야겠지만 대외경제정책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중요 정책 결정은 부총리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F씨는 “한국의 총리는 정책조정 기능과는 거리가 먼,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2인자’에 불과하다”며 “부총리와 총리가 정책조정권한을 나눠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다만 부총리들은 필요에 따라 총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G씨(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는 “청와대와 부총리 사이 갈등이 생기면 총리를 물고 늘어져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H씨(김대중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는 “대통령 보고 전 중요 사항은 총리에게 메모로라도 간단히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참모가 전면에 나서면 안 돼”
역대 경제수장들은 경제부총리와 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간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내놨다. 법적 지위는 총리>부총리>경제수석 순이지만 경제정책에서의 실질적 권한은 수석>부총리>총리 순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부총리들은 경제수석이 대통령을 ‘호가호위(狐假虎威)’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씨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의 의견을 따라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리로 가게 마련”이라며 “때로는 부총리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해 누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이 실질적으로 정책조정의 핵심 멤버임을 인정하고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H씨는 “경제수석을 끌고 들어와 옆에 앉혀 놓고 회의를 하니 타 부처 장관들이 조금은 압력을 느끼더라”고 술회했다. 경제수석이 주도하는 서별관회의에 대해선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E씨는 “김대중 정부 초기만 해도 서별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전부 문서로 남겼다”며 “법률적 책임을 떠나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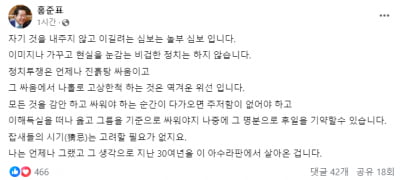
![가장 기대되는 당선자 1위 조국…이준석·이재명 順 [갤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800.3.jpg)
![장래 지도자 이재명 24%…한동훈 9%p 떨어진 15% [갤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8889.3.pn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