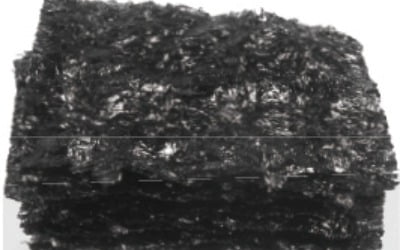[대우조선에 또 혈세] "추가지원 없다"던 정부는 말 바꾸고…대선주자는 "대우조선 살려야"
정부가 23일 내놓은 대우조선해양 해법은 ‘일단 살리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 자금 수혈과 채권 출자전환, 채무유예를 모두 합해 7조원가량을 지원해 대우조선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회사채 투자자들의 동의를 끌어내면 대우조선은 2015년 10월에 이어 또다시 외부 자금으로 연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당장 도산하면 59조원의 국가 경제 손실이 우려된다며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형적인 ‘대마불사(大馬不死)’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 추가 지원 왜 하나 정부 "수주예측 실패했다" 인정
정부는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뒤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고 확언했다. 지난해 대우조선이 극심한 수주 가뭄을 겪을 때도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허언(虛言)이 됐고, 정부는 ‘말 바꾸기’를 인정하면서도 불가항력의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115억달러를 수주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실제 수주가 15억달러에 그치면서 대우조선 상황이 꼬일 대로 꼬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저가 수주 문제가 2015년 불거졌음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상황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해에도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의 회생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2) 파산 땐 59조 손실? 법정관리 때 수주취소 예상 엇갈려
정부는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대란’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삼정회계법인 추정치를 근거로 대우조선이 당장 도산하면 국가 경제적으로 59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조 중인 선박 114척이 고철이 되면서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 32조2000억원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여기에 금융권 피해와 최대 5만명의 실직, 협력업체 연쇄 부도 등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수치다.
하지만 과장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채권단 출자전환과 상환유예 등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숫자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 사례를 볼 때 급격한 수주 취소는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건조가 많이 진척된 경우 해외 선주사로선 선수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완성된 배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3) 한진해운과 형평성 "국가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자금 지원을 요청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고 회사는 결국 파산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법정관리 대신 추가 지원을 택했다. 정부는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의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한진해운은 대주주 한진그룹이 있었던 반면 대우조선은 정부 소유의 산업은행이 대주주여서 똑같은 지원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다르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진해운은 당시 세계 7위권 해운사였지만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대우조선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진해운은 전체 채권 가운데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해 채권은행 주도로 회생시키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그러나 한진해운 파산으로 약 17조원(선주협회 추산)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두 회사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주인이 없고 규모가 큰 회사는 ‘대마불사’로 처리한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4) 대선 코앞인데 발표 '구조조정 실패' 비판 피하기?
이번 추가 지원안 발표 시점을 두고서도 말이 많다. 정치권에선 “차기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책을 서둘러 내놨어야 하나”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가 급박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차기 정부의 원활한 경제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선거에 쏠린 시점을 기다려 정부가 지원안을 내놨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구조조정 실패 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점을 고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태명/이현일 기자 chihir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