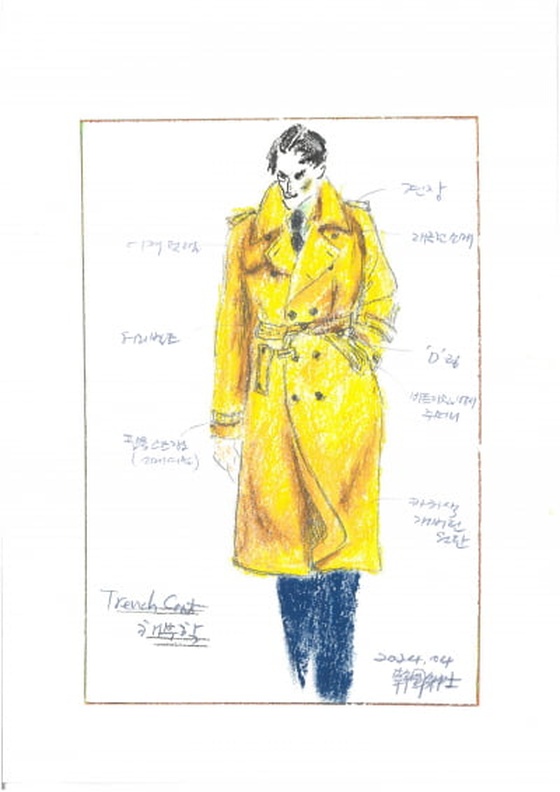[오춘호의 논점과 관점] 30년 만에 재연된 반도체 전쟁
![[오춘호의 논점과 관점] 30년 만에 재연된 반도체 전쟁](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01.12355060.1.jpg)
레이건 정부는 반도체가 포함된 모든 일본 전자제품에 100%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미·일 반도체 분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 30년 전의 일이다. 많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피하려고 대만으로 이전했다. 대만이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은 배경의 하나다. 한국 기업도 이때 기회를 잡았다.
미일 분쟁으로 시장 재편
미·일 반도체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로 참가한 사람이 로버트 라이시저 신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당시 39세의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유에스스틸의 변호사로 일할 만큼 철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다. 라이시저는 몇 년 전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전한다면 중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에게서 반도체의 중요성과 기술적 진화 과정을 들었다고 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도 며칠 전 청문회에서 “중국 반도체 육성 정책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중국 반도체를 견제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출하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소비하고 있다. 석유 수입보다 반도체 수입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수출 전자제품에 들어가지만 내수 소비도 갈수록 늘고 있다. 대표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가 난징에 300억달러를 들여 메모리공장을 짓고 우한에도 그와 맞먹는 240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 두 공장을 합쳐도 전체 국내 소비로 보면 새 발의 피다.
미중 전쟁,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야심은 매우 크다. 안보에서도 반도체 기술은 사활적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자립은 필요하다. 중국 반도체로 완성된 중국산 제품을 갖겠다는 욕망도 있다. 중국 정부가 1500억달러라는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과 안보 문제 등이 미국 정부엔 눈엣가시다.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자칫 패권까지 잃을 수도 있다. 칭화유니그룹이 2015년 미국의 마이크론을 사려 했지만 미국 정부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이달에 발행된 미국기술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서 ‘반도체분야의 미국 장기 리더십 확보’에선 중국 산업정책에 의해 드러나는 반도체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대놓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3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반도체산업을 키울 수도 있다. 한국 반도체산업이 미·일 반도체 분쟁 이후 급성장한 건 사실이다. 트럼프의 대중 반도체 전략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섣불리 추정하기 어렵다. 역사가 이번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편을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춘호 논설위원·공학박사 ohcho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6042282.3.jpg)
![[윤성민 칼럼] 韓 대파로 싸운 날, 美·日은 의형제 맺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14213006.3.jpg)
![[데스크 칼럼] 통신사는 왜 동네북이 됐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2124465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