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고임금 귀족노조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파업 공화국’이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촉발된 금융·공공부문 연쇄파업으로 인해 올 들어 근로손실일수(파업참가자 수×파업시간/하루 8시간)는 105만9000일로 지난해의 두 배(44만7000일)를 넘어섰다. 사실상 ‘연중 행사’가 된 파업 관행을 바꾸려면 파업을 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몇 차례의 형식적인 교섭 후 노동위원회 조정만 거치면 합법 파업이 되는 제2조 △잦은 파업의 빌미가 되는 너무 짧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제32조) 등이 꼽힌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업 요건 등을 규정한 국내 노조법을 해외 선진국과 비교 평가해 봐야한다”며 “사업장을 점거하는 식의 파업 방식과 관행은 바뀔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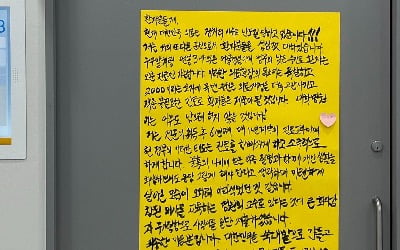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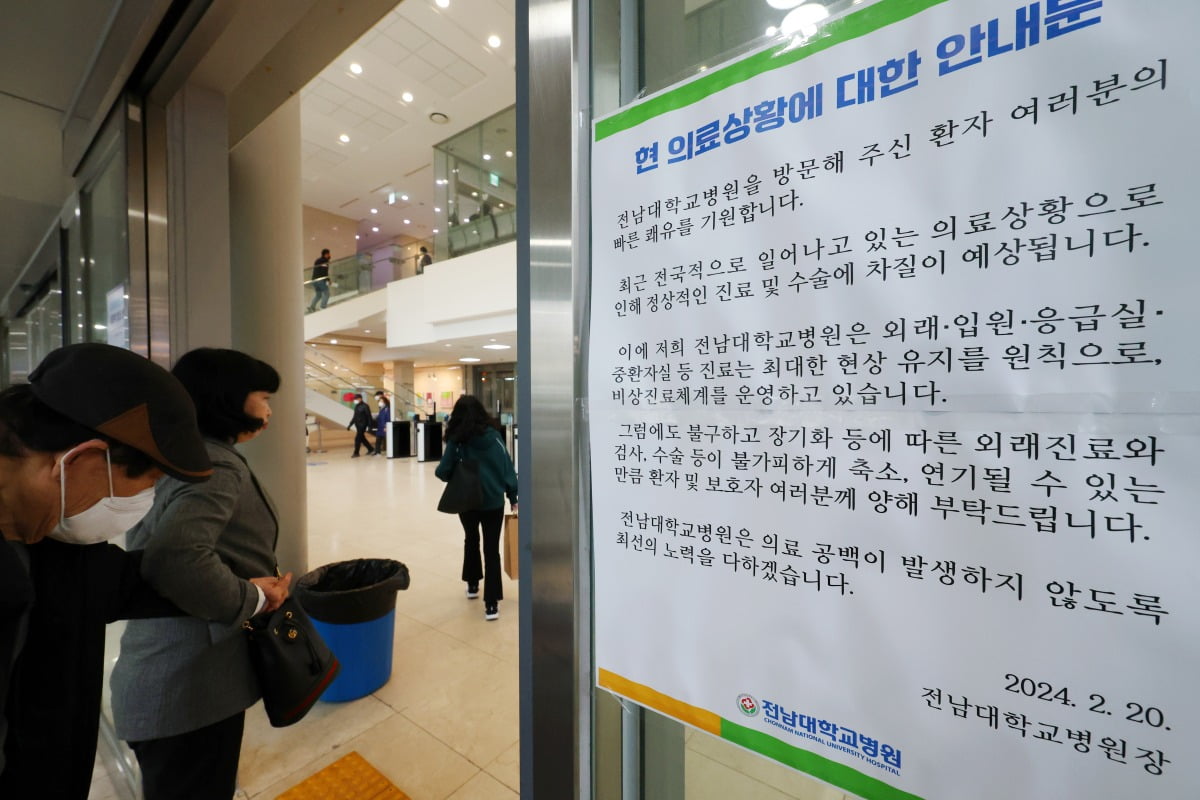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