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마다 한 팀…길거리공연 한밤 '볼륨 경쟁'
소음과 거리문화 사이
홍대 곳곳 우후죽순 생기며 자정 넘어서까지 스피커 공연
팀별로 앞다퉈 소리 키우기…상인·주민들 "소음공해 심각"
"규제보단 문화로 인정해야"…일각선 관광자원 육성 목소리

길거리공연의 메카로 알려진 ‘홍대 걷고 싶은 거리’가 올해 봄부터 부쩍 늘어난 거리 공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밤늦은 시간까지 요란스러운 공연이 이어지면서 ‘시끄러운 거리’가 됐다는 불만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관광자원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길거리 공연 붐의 배경에는 가수 장재인, 버스커버스커, 김지수, 딕펑스 등 ‘홍대 길거리 출신 스타’의 탄생이 있다. 올해 초부터는 댄스그룹은 물론 밴드 공연, 마술 공연, 비눗방울 공연까지 등장했다. 1~2년 전만 해도 5개 팀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중·고등학생까지 길거리공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공연자는 “점심시간 전부터 나와 명당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저녁시간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연할 수 있다”며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에는 새벽 2~3시까지 길거리공연이 열리면서 인근 상인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대 인근의 한 맥줏집 주인은 “길거리공연이 마구잡이식으로 열리다 보니 소음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연팀 대부분이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다른 팀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고 서로 볼륨을 키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걷고 싶은 거리 옆 골목 주택가 주민과 근처 게스트하우스 숙박객들은 “소음 탓에 새벽에도 창문을 열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거리에 설치된 확성기 등은 오후 10시 이후 60dB(보통 대화 수준) 이상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한 사례는 없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직접적인 소음 원인이 측정돼야 하는데 여러 소리가 섞이다 보니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길거리공연을 규제하기보다는 문화로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람블로나 거리 등 외국 유명 관광지처럼 길거리공연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마포구도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길거리공연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키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길거리공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며 “밤 10시 이후에는 지나친 소음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연은 살리고 주민 민원은 줄이는 윈윈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단독]"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주네"...선넘은 '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789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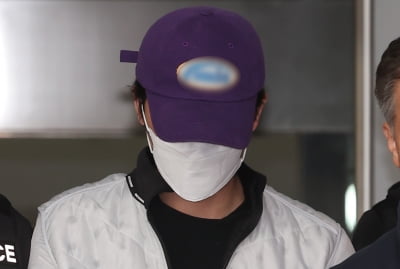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노인들은 아무리 말려도 왜 운전대를 놓지 않을까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6756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