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업인의 죽음…'43년 롯데맨' 이인원 부회장 자살
검찰 소환 앞두고 4쪽짜리 유서 남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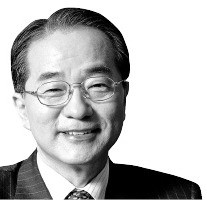
이 부회장은 26일 오전 7시10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산책로에서 발견됐다. 목을 맨 넥타이가 끊어져 바닥에 웅크린 채였다.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부검 후 자살로 결론 내렸다. 현장에 있던 이 부회장의 제네시스 차량에선 이 부회장의 부인 사진이 나왔다. 자필로 쓴 넉 장짜리 유서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아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동안 앓고 있던 (엄마) 지병을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다. 힘들었을 텐데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롯데그룹 2인자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를 이끌던 그는 검찰의 롯데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롯데그룹에는 비자금이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란 취지였다는 게 사정당국의 전언이다.
한 재계 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과 무한책임을 지우려는 세상의 눈이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조사에선 해명할 기회도 없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다. 수십년 기업인으로서 쌓은 명예와 업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 그 압박은 이전에도 기업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박건석 전 범양상선 회장(1987년),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2003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2004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2015년) 등도 그랬다.
롯데 내부에서는 검찰이 조사하는 각종 혐의를 이 부회장이 모두 안고 가려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신 회장에게 검찰의 칼끝이 향하는 것을 막는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죽음으로, 그와 롯데그룹을 둘러싼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검찰수사, 자신과 기업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기업인의 죽음’이란 악순환은 30년째 계속되고 있다.
정인설/양평=마지혜 기자 surisur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강남보다 가성비 좋다"…외국 MZ들 다시 찾는 동네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6134.3.jpg)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