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라 쓰고 '이익집단'이라 읽는다
친박-비박 '10년 전쟁'
복당·총선백서 놓고 또 충돌…상임위원장 경선도 '계파 대결'
더민주는 친노·친문이 '좌지우지'
사익 우선…공익은 뒷전
"정권 창출보다 공천이 중요"…노선 투쟁 아닌 '패거리 정치'
1인 보스의 말은 곧 헌법
보스에 충성-미래 보장 '담합'…공정한 당 운영 시스템 사라져

지난 16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 7명의 탈당파에 대한 전격적인 일괄 복당을 허용한 것을 두고 벌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를 반성한다며 준비하고 있는 ‘국민백서’의 조속한 공개를 놓고도 친박은 반대, 비박은 찬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계파 해체 선언 사흘 만에 치른 당내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경선은 철저히 ‘계파 투표’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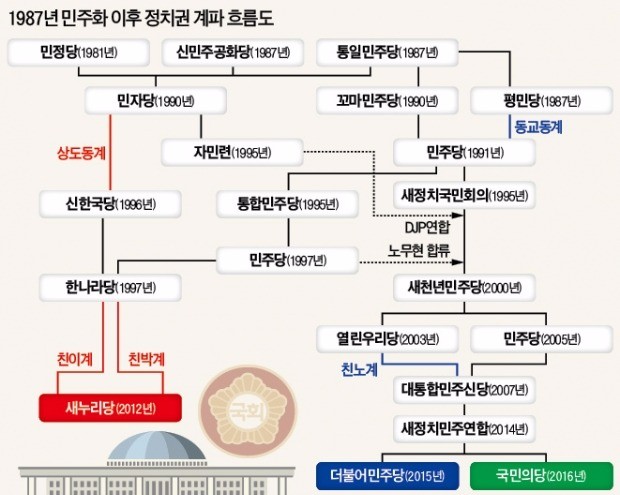
계파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물론 계파정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념적, 정치적 소신에 따른 정치적 결사체라면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치적 시각, 이념에 따라 토론이 이뤄지고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점에서다.
계파정치의 폐해는 공익보다 공천 등 사적 이익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이념과 정책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계파정치의 특징이다. 돈과 공천권을 갖고 계보를 관리했던 ‘3김(金) 시대’가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에게 정권 창출보다 중요한 것은 공천”이라는 말이 정설이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친이(친이명박)계가 친박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했고, 2012년엔 반대로 친이계가 보복을 당했다. 공천을 따기 위해선 계파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새누리당은 보수를 가치로 그것을 실현하려는 정당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야겠다는 이익개념으로 모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윤선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은 “계파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런데 그 계파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선수(選數)를 더 오래 쌓을 수 있는가 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점심을 먹어야 하지?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책을 비롯해 굵직한 주제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현안마다 충돌하니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자조했다.
계파정치의 또 다른 폐해는 1인 보스만 바라본다는 점이다. 능력보다는 보스에게 줄을 서 정치적 앞날을 보장받는 구조다. 당은 보스의 사유물이나 다름없다. 일종의 ‘담합정치’다.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당 운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친박계나 친문계 등은 3김 시대와는 성격이 달라졌지만 아직 일정 부분 보스 중심의 문화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계파의 뜻과 반대되는 목소리는 수용되기 어렵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수정·보완 주장을 했다가 주류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은 게 단적인 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대통령실 "전공의 복귀 방해 사건 법에 따라 엄정 조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2579247.3.jpg)


![중동 긴장감 완화에 안도…나스닥 1.1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47545.1.jpg)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9472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