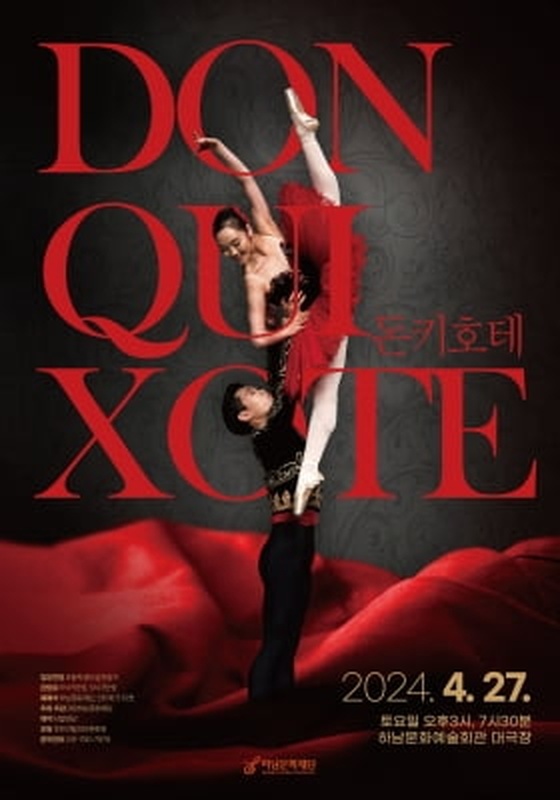[도서관장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명과 청 사이에 섰던 조선, 미·중에 낀 지금과 닮았네
병자호란
![[도서관장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명과 청 사이에 섰던 조선, 미·중에 낀 지금과 닮았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6/AA.11848037.1.jpg)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놓고 벌어진 이 안보외교의 전장 에서 우리는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못하고 스스로 서지도 못한 채 그렇게 어정쩡하게 전장 밖에 있었다. 우리는 어느 쪽에게도 존중받지 못했고 우리의 지지나 반대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들지 않았다.
지정학적 운명으로 이 땅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위태로운 것이 근래의 일은 아니다. 우리는 오랜 기록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한다. 지금도 임진강변의 차디찬 벌판부터 고성의 깊은 산중까지 이어진 철책이 그 비극의 결과를 증명한다. 거대한 이념의 두 소용돌이 사이에 놓인 한반도에서 아이들은 의지할 곳을 잃었고 수많은 아버지가 총탄에 쓰러졌으며 가족들은 서로 생사를 알지 못했다. 민족은 상잔해 끝없는 피와 아픔으로 뒤덮인 끝에 다시 합치지 못한 채 오늘을 맞았다.
![[도서관장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명과 청 사이에 섰던 조선, 미·중에 낀 지금과 닮았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6/AA.11848023.1.jpg)
저자는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병자호란을 다룬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사실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명분론에 매몰된 조선 당대 지도층의 좁은 시대적 안목과 분열, 국제 정세에 대한 몰이해, 부패로 인한 개혁동력의 상실이 어떻게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를 파국으로 이끌었는지 독자에게 보여준다.
청과 무역을 재개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명의 모문룡을 지원할 것인가 제재할 것인가. 홍타이지의 칭제(稱帝)를 인정할 것인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국내에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난사군도의 중국 진출을 저지하려는 미국 입장을 지지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미·중의 대립 속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카를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Napoleon)》에서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했다. 우리의 역사는 잦은 비극으로 점철돼 왔다. 지금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병자호란》에 나오는 조선의 비극과 다른 희극의 역사를 쓰기 위한 노력을 책 속의 과거에서 찾아볼 때다. (푸른역사, 전 2권, 각권 396쪽, 각권 1만5900원)
조형섭 < 용산도서관장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스포츠 경기 베팅에서 36년 연속으로 돈을 번 사나이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1018.3.jp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