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 이대리] 돌아온 록페스티벌 시즌…직장인들은 '극과 극'
비 락페족, 아는 노래는 없고…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날만을 기다렸다
공연 일정 맞춰 여름휴가 신청
티켓·의상…수십만원 투자 불사
'군중 속의 고독'이 따로 없네
덥고, 시끄럽고…'아이고 허리야'
비싼돈 주고 구석에서 맥주만 홀짝
![[김과장 & 이대리] 돌아온 록페스티벌 시즌…직장인들은 '극과 극'](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724731.1.jpg)
5월만 기다렸다…‘락페족’ 이대리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 대리(32)는 지난달 일찌감치 연차 휴가를 신청했다. 조만간 열릴 록페스티벌에 다녀오기 위해서다. 아직 몇 주나 남았지만 이 대리는 준비에 바쁘다. 입고 갈 화려한 의상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매달 월급 5만원씩을 모아 이 시즌에만 60만원 정도를 록페스티벌 의상에 투자한다. 이 대리는 “1년에 한 번 즐기는 이 시즌을 좀 더 화끈하게 즐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록페스티벌에서 톡톡 튀는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만 봐도 1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의 한 제약회사에 다니는 최모 대리(29)도 여름휴가를 록페스티벌 일정에 맞추느라 고생하고 있다. 7월 중순에 열리는 록페스티벌에는 최 대리가 좋아하는 국내외 가수가 대거 참석한다. 하지만 아직 회사에선 휴가를 가라는 통보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여름 성수기 기간이라 이 시기에 휴가 지원자가 몰려서다. 사흘치 티켓값에 옷까지 수십만원을 투자해놓은 최 대리는 맘이 급하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윤모 과장(35)은 주로 캠핑이 접목된 뮤직페스티벌을 즐긴다. 락페족인 윤 과장과 달리 그의 아내는 시끄러운 뮤직페스티벌을 싫어해서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캠핑하면서 재즈음악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선택했다. 윤 과장은 “캠핑하며 음악도 즐기다 보니 아내도 뮤직페스티벌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새로 사놓은 캠핑의자 타프 등 각종 캠핑용품을 쓸 생각에 벌써부터 들뜬다”고 전했다.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네요”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정모 대리(33)는 록페스티벌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그는 지난해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소개팅녀에게 “록페스티벌에 가자”고 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친구들이 “여자는 록페스티벌을 좋아한다”고 알려줘서다. 예상대로 소개팅녀는 정 대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소위 ‘초짜’라는 것이 들통 날까 봐 인터넷에서 ‘록페 코디법’ ‘록페 준비물’ 등을 검색했다. 수건, 돗자리 등을 준비하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상상한 그 이상이었다. 소개팅녀를 비롯해 대다수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밤낮없이 흔들어댔다. 록페스티벌의 묘미는 ‘떼창’이라는 게 소개팅녀의 얘기였다. 하지만 정 대리는 즐겁지 않았다. 아는 노래도 없고, 타고난 ‘몸치’여서다. 구석진 곳에서 혼자 맥주만 홀짝홀짝 마시던 그는 내리는 소낙비에 쫄딱 젖었다.
지난달 한 홍보대행사로 이직한 김모 대리(28). 그는 록페스티벌의 ‘록’자만 나와도 학을 뗀다. 원래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해서다. 지난해 친구들에게 이끌려갔다가 발만 밟힌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마음에도 없는 록페스티벌 티켓을 사야만 했다. 새로 옮긴 회사의 팀원들이 자칭 ‘공연 마니아’여서다. 지산에서 열리는 유명 록페스티벌에 단체로 가기로 한 그들이 “김 대리도 갈 거지?”라고 물어오자, 할 수 없이 “예”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 인사과에서 일하는 이선호 씨(35)는 지난해 어린 여자친구 탓에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 이씨보다 일곱 살 어린 여자친구는 록페스티벌 마니아다. 이 시즌이 다가오면 지방 공연을 갔다가 자고 오는 일도 허다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록페스티벌에서 눈맞는 남녀가 많다”는 말을 들었다. 불안해진 이씨는 여자친구를 따라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표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다. 예매 없이 표를 사려면 ‘웃돈’을 줘야 했다. 그렇게 따라간 록페스티벌은 힘에 부쳤다. “내 취향의 음악도 아니고, 밤새 춤추며 노는데 피곤해 죽는 줄 알았죠.”
“오늘도 저는 일합니다”
한 온라인 홍보 대행사에 다니는 박모 과장(37)은 지난달부터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주말에도 몇 주째 출근 중이다. ‘록페스티벌 특수’ 탓이다. 박 과장의 회사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심혈을 기울인 축제를 홍보하는 게 그의 몫이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담당 공무원의 전화를 받는다. 지난 주말도 박 과장은 팀 동료 한 명과 주말 내내 지자체가 요구한 광고문구를 고치느라 밤을 새웠다. “남들은 5월이면 뮤직페스티벌 가죠? 저희는 이 시즌이 지나기만 기다립니다.”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 최모씨(32)는 지난달 말 중고거래 카페에 ‘뮤직페스티벌 티켓 2장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 회사 동료와 함께 5월 축제에 가기 위해 2월부터 미리 끊어둔 티켓이었다. 하지만 5월 근무표를 보니 해당 날짜에 근무가 잡혔다는 사실을 알았다. 심지어 이달엔 주말마다 근무다. “지난해에도 이 시즌에 근무가 잡혀 즐기지 못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가을 뮤직페스티벌은 갈 수 있을까요? ㅠㅠ”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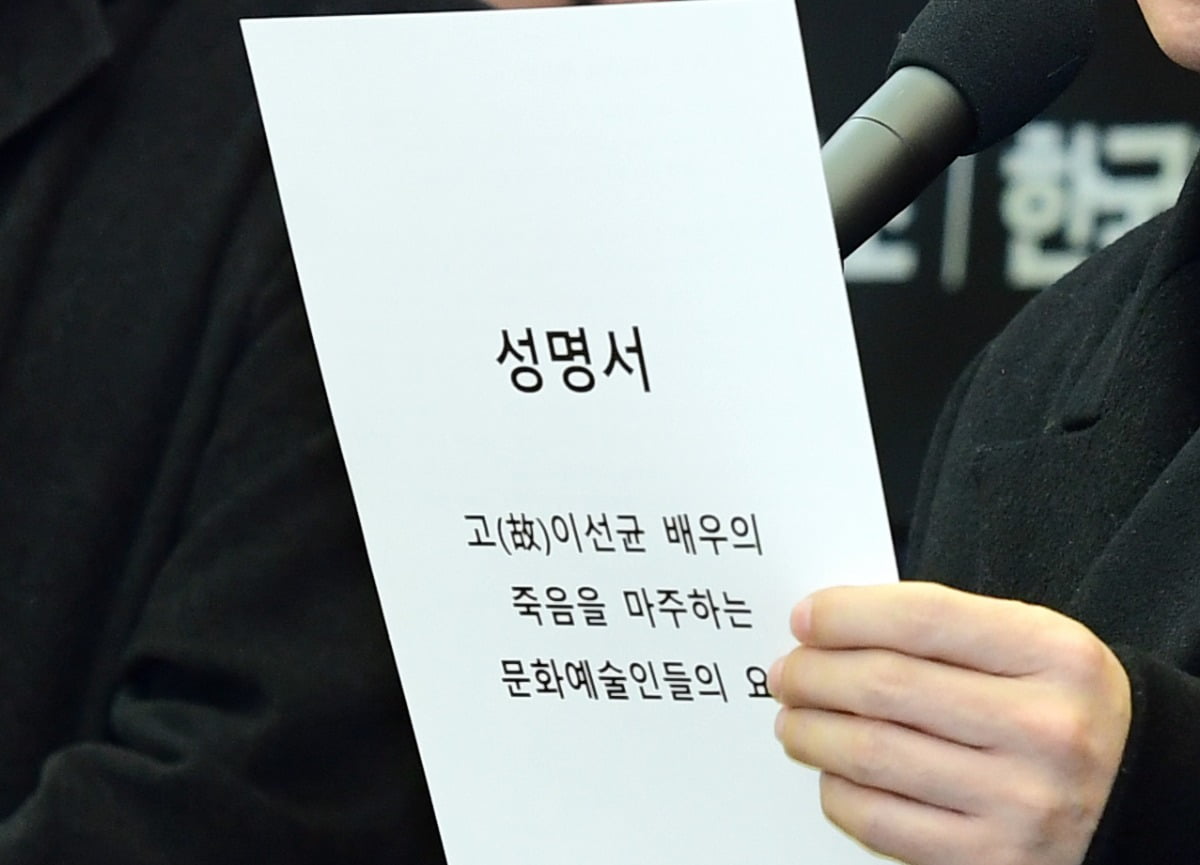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