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라이프] 정준 쏠리드 사장·팬택 대표 "삼성·애플과 왜 맞짱 뜹니까? 틈새 수요 충분한데…"
모두가 고개 저었지만…"경쟁방식 바꾸면 충분히 회생"
3700여개 팬택 특허에 주목…'가성비' 좋은 중저가폰이 목표
사업 안하게 생긴 사업가, KT 연구원 출신 벤처기업협회장
"교과서대로" "할거라면 제대로"…꼼수 안부리는 프로의식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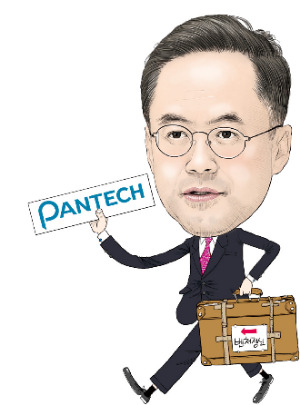
이 한마디면 대부분 수긍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 이외에는 스마트폰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말이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택의 매각 작업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다.
인수자가 없었다면 팬택은 청산될 운명이었다. 건물은 팔리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술은 사라질 처지였다. 팬택이란 이름의 브랜드도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다 포기했을 때 한 사람만은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정준 쏠리드 사장(사진)이다. 팬택 인수에 약 500억원을 과감히 투자했다. 지난달 팬택의 대표 자리에도 올랐다. ‘벤처 신화’를 썼다가 몰락한 팬택을 벤처업계의 수장(벤처기업협회 회장)인 정 사장이 살리겠다는 의무감도 있었다.
그는 “팬택이 가진 차별화된 기술을 봤다”며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면 팬택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맞짱 뜨지 않아”
![[비즈&라이프] 정준 쏠리드 사장·팬택 대표 "삼성·애플과 왜 맞짱 뜹니까? 틈새 수요 충분한데…"](https://img.hankyung.com/photo/201601/AA.11085615.1.jpg)
“옷을 서너 업체가 독점할 수 없듯 스마트폰도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한두 기업이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하지 않는 틈새에도 수요는 충분합니다.”
그런 조짐은 이미 보인다. 한 중소기업이 내놓은 중저가폰 ‘루나’의 돌풍이 그 예다. 작년 9월 출시된 ‘루나폰’은 초도물량 매진 기록을 세웠다. 석 달 만에 국내에서만 15만대 가까이 팔렸다.
정 사장은 처음부터 삼성전자, 애플과 경쟁할 생각이 없었다. 수천억원을 투입해 승부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었다. 최신 기술은 아니라도 개성 있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제품이 목표였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 들지 않았다. 제품, 시장,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를 찾아 같이 가는 길을 택했다. 그런 의미에서 팬택은 최적의 회사라고 생각했다.
“협력으로 살 길 찾는다”
그는 먼저 팬택의 기술을 눈여겨봤다. 특허 3700여개가 있었다.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기술만 있으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수백 곳에 달하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공장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체 기술과 브랜드 없이 ‘짝퉁’을 찍어내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팬택의 기술이 절실하다고 봤다.
정 사장은 “정보기술(IT)업계에서 한국이란 국가 브랜드 신뢰도와 팬택의 기술력 덕분에 앞으로 3~4년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며 “기술 라이선스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직접 생산하고 싶어 하는 국가와 손잡는 것도 생각했다. 팬택이 기술을 대면 현지 국가에선 자본, 땅, 인력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수입만 하는 스마트폰을 자국에서 직접 제조하고 싶어 한다. ‘아쉬울 게 없는’ 주요 스마트폰 기업이 여기에 굳이 응할 이유는 없다. 팬택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기술은 있지만 입지가 약하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을 여지가 충분하다.
자체 브랜드를 버리고 전문 제조업체로 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구글에서 ‘구글폰’이 필요하면 개발부터 디자인, 제조까지 다 팬택이 하고 브랜드만 구글을 다는 식이다. 전문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판단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미뤘다. 일단 올해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팬택 자체 브랜드로 중저가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때 반응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1998년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비즈&라이프] 정준 쏠리드 사장·팬택 대표 "삼성·애플과 왜 맞짱 뜹니까? 틈새 수요 충분한데…"](https://img.hankyung.com/photo/201601/AA.11086678.1.jpg)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창업에 나섰다. 돈 많이 벌기 위해 창업한 것은 아니었다.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하면 뭐든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컸다. 일단 회사를 세우고 뭐로 돈 벌지 정했을 정도였다.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규모를 키웠다. 광중계기 등 익숙한 분야인 이동통신 장비 쪽을 택했다. 처음에는 SK텔레콤 KT 등 국내 이동통신 기업을 상대로 제품을 팔았다. 제법 인력이 갖춰지고 기술이 쌓이면서 해외시장을 뚫었다. 이게 ‘대박’이 났다. 2012년 미국 지하철 277개 역에 분산안테나시스템(DAS)이란 것을 깔았다. 2013년 일본 1위 통신사 NTT도코모의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중남미 유럽 중동 등의 지역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갔다. 2014년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서며 ‘중견 벤처기업’이 됐다.
일할 때는 프로의식 강조
처음 그를 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사업 하게 안 생기셨네요.”
전형적인 기업가적 모습과 많이 달라서다. 기업가는 저돌적이란 인상을 풍긴다. 정 사장은 말을 할 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한다. 민감한 내용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 그러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설명한다. “연구원 출신이라 그렇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사결정 때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작년 8월 법원과 팬택 인수를 놓고 논의할 때도 그랬다. 그가 가장 힘들어한 것 중 하나는 직원 구조조정이었다. 법원과 쏠리드는 당시 팬택 직원 900여명 중 절반가량인 400명만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었다. 더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자 정 사장은 ‘인수대금을 전부 고용승계에 쓰는 것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할 때는 ‘프로의식’을 강조한다. 직원들에게 “프로가 되자”고 늘 말한다. 업무를 어설프게 하지 말고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하란 얘기다. 회사 안에 ‘쏠리드 프로상’이란 것도 제정했다. 매년 프로의식이 있는 직원들을 뽑아 1000만원씩 포상한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큰 감동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교과서대로 하자”는 말도 자주 한다. 꼼수 부리고 조금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는 ‘비용’으로 모두 돌아온다고 그는 믿는다.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가장 저렴한 방식이란 것이다.
■ 정준 사장 프로필
△1963년 서울 출생 △1982년 서울 양정고 졸업 △1986년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1988년 미국 스탠퍼드대 전자공학 석사 △1993년 미국 스탠퍼드대 전자공학 박사 △1993년 일본 히타치 기술연구소 객원연구원 △1994년 KT 연구개발본부 선임연구원 △1998년 쏠리드 창업 △2015년 벤처기업협회 회장 △2015년 팬택 대표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