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 긴 울림…서정시의 절대미학을 만나다
'오래 벼렸더니 둥글어졌다'…절제미 호평
7~8일 시인과 남해 문학기행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긴 울림을 주는 서정시의 절대 미학. 좋은 시에는 군말이 없다. 고두현 시인(사진)의 새 시집 《달의 뒷면을 보다》(민음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첫장부터 삶과 사물의 중심을 곧바로 건드린다. 69편의 시가 대부분 그렇다. 난해하고 긴 시가 난무하는 시단에서 정통 서정시의 본령을 지켜온 시인답다.
그의 시는 서정과 서경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과 세상을 향한 궁극의 사랑을 노래한다. 시어는 더 간결해졌고 서정은 더 깊어졌다. 사랑의 밀어는 더 은밀하고 농염해지고, 세태를 직시하는 언어는 더 곧고 선명해졌다. 1993년 등단 후 7년 만에 첫 시집을 낼 정도로 과작(寡作)인 그가 두 번째 시집 이후 10년을 기다린 이유가 ‘오래 벼렸더니/ 둥글어졌다’는 한마디에 응축돼 있다.
1부에 실린 첫시는 선시를 뛰어넘는 절제와 압축미의 표상이다. ‘처음 아닌 길 어디 있던가// 당신 만나러 가던/ 그날처럼.’(‘초행’ 전문) 3행 21자로 노래한 사랑시의 절창. 사랑은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고 떨리는 첫길이자, 늘 새롭게 떠나는 초행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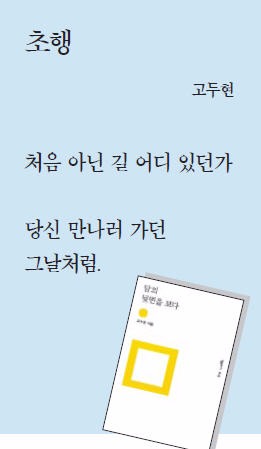
‘목이 긴 호리병 속에서 수천 년 기다린 것이/ 지붕 위로 잠깐 솟았다 사라지던 것이/ 푸른 밤 별똥별 무리처럼 빛나는 것이// 오, 은하의 물결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너의 눈부신 뒷모습이라니!’(‘달의 뒷면을 보다’ 부분)
이번 시집을 편집한 문학평론가 박혜진 씨는 “고두현의 시는 언제나 근원적인 슬픔에 닿아 있다”며 “맑고 투명한 슬픔이 스산한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졌다는 건 이상한 일이지만 시인은 그 이상한 힘으로 숱한 마음을 치유해준다”고 평했다.
《달의 뒷면을 보다》는 출간한 지 한 달도 안 돼 3쇄에 들어갔다. 문학지망생들과 직장 독서동아리의 단체 주문이 많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시를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지만, 독자의 내면과 제대로 소통하는 시는 언제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분짜리 책 소개 영상(북 트레일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기다. 책 내용을 영상으로 함축한 북 트레일러는 베스트셀러 단행본을 위한 홍보물이 대부분인데, 시집 한 권을 위해 제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짧고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그의 시가 독자의 필사(筆寫) 소재로 자주 인용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통 서정시의 부활을 알리는 반가운 징조’라는 문단의 평가도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오는 7~8일에는 고 시인과 함께하는 남해문학기행이 열린다. 전작 《늦게 온 소포》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를 포함해 이번 시집에 실린 작품의 창작 산실을 찾는 행사다. 표제작이 탄생한 섬노래길 코스와 구운몽길 코스, 숲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물건방조어부림 등 남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두루 만날 수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23699.3.jpg)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