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키우는 워킹맘…힘들지만 행복해요"
다둥이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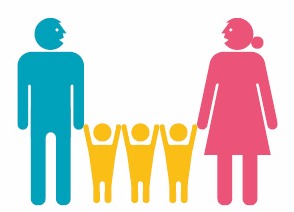
송진우 씨(38)는 다음달 셋째 아이가 태어난다며 환하게 웃었다. 동갑내기 부인이 ‘겁도 없이’ 먼저 셋째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단다. “연년생인 다섯 살 아들과 네 살 딸을 ‘죽을 힘을 다해’ 키우고, 이제서야 한숨 돌리나 했는데 또 아이를 갖겠다는 아내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하. 양가 어른들도 아연실색했고요. 5년간 육아에 동참하면서 다들 지쳤거든요.”
아이 둘에 직장까지 있는 송씨의 부인이 아이를 또 낳겠다고 한 건 “아이들에게 여러 명의 형제를 갖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외동딸로 자란 아내가 몇 년 전 장인어른 상을 치르면서 무척 힘들고 외로워했어요.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굳혔다네요.”
이진희 씨(37)는 3년 전 계획에 없던 셋째를 가졌다.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 뒤 직장 복귀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이씨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나쁜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너무 두려웠다”고 말했다. 남편도 미웠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싫었다. 다들 셋째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며 이씨를 걱정했다. 우울증까지 왔다.
그랬던 이씨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셋째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배려 덕분이었다. 아이 둘을 둔 워킹맘이었던 이 회사의 사장은 이씨에게 흔쾌히 추가 육아휴직 후 복직 기회를 약속했다. 탄력근무제를 적용받아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워졌다.
이들은 한 명도 키우기 힘든 아이를 셋이나 키우면서 어떻게 일까지 해내는 걸까. 공통점은 ‘육아는 엄마만의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우선 남편이 적극적으로 육아를 분담했다. 이씨의 남편은 첫째 아이를 ‘전담 마크’한다. 초등학생인 아이의 학원과 학교 숙제를 챙기고 학부모 모임까지 나간다. 직장보육시설도 큰 힘이다.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퇴근할 때까지 마음이 놓인다. 이씨는 양가 부모님과 형제, 당숙모까지 총 여섯 명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여성의 사회생활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길을 찾다 보면 방법이 생긴다”며 “셋째를 낳고 행복도 세 배가 됐다”고 웃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LG엔솔, 1분기 영업익 1573억…전년비 75.2% 감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0283.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