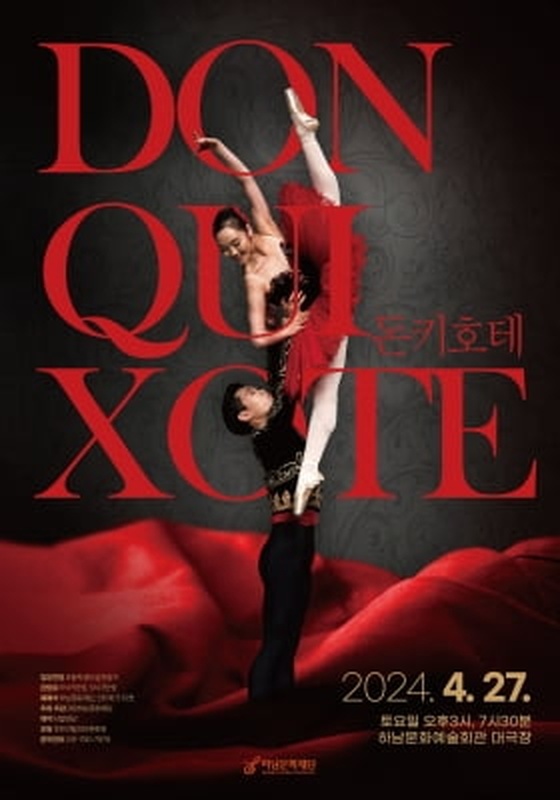[정규재 칼럼] 헌법 위에 국회법
그러나 엉터리 법률들은 더 많다
그래서 3권분립이 필요한 것이다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정규재 칼럼] 헌법 위에 국회법](https://img.hankyung.com/photo/201506/02.6926659.1.jpg)
그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든다. 시행령을 교묘하게 뒤트는 방법으로 법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법에 기반했으되, 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권력을 창출해내는 경우도 흔하다.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언어적 속임수 외에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들은 다반사다. 행정입법도 그렇지만 유권해석 문제도 심각하다. 가장 심한 경우라면 ‘OO 등(等)’이라는 규정의 ‘등’ 자를 확장 해석하면서 제멋대로 행정판단을 내리는 경우조차 많다. 적절한 사례는 아니지만 론스타도 은행법 관련 규정의 ‘OO 등(等)’에 의거해 특인을 받았다. 매주 발행되는 관보를 샅샅이 살피지 않으면 어떤 시행령이 만들어지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공무원들은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호도한다. 각 시행령에는 각기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익집단이 활약하고 로비가 춤을 추며 은밀한 협조 전선이 만들어진다. 규제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주무관들이 방석 아래에 진짜 규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의 악성규제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종걸 의원의 문제 제기는 그런 면에서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시행령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무소불위의 규제 권력이나 특혜 조치, 다시 말해 디테일의 악마를 숨겨 놓는다. 그게 관료들의 은폐된 힘이다. 놀랍게도 국회가 이 과정에 협조하는 경우도 많다. 이종걸, 유승민 의원도 종종 그렇게 한다. 법률은 적당히 아름다운 말로 채워놓고 규제의 실질은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의원들은 스스로를 부드럽게 면책한다. 이는 논란과 대치, 그리고 간혹 무지로부터 오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흔히 선택하는 입법 전략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시행령’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들은 행정부에 대한 질투도 숨기지 않는다. 유승민 의원이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는 당이 주도하겠다”고 말할 때도 그런 심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헌법 위에 국회법이 있는 꼴이다. 국회법은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부정하고 있다. 지금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그렇다. 법과 시행령의 갈등은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것이 헌법이다. 그게 3권분립이다. 물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법 그 자체다. 시행령이래 봤자 법률이 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률 한 건에 평균 두 건의 시행령이 만들어진다. 작년만 해도 809건의 법률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령 902건, 총리령·부령 776건이 만들어졌다. 자의적이고 폭력적이며 국민의 재산과 행동을 제멋대로 규제하고 간섭하는 법률들이 문제의 뿌리다.
만일 국회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입법을 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개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국회를 인민위원회로 대체하자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인민위원회는 사법 입법 행정을 한 손에 틀어쥔다. 그게 인민독재 이론이다. 지금 이종걸,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은 문제가 많다. 그러나 국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법률은 문제가 더 많다. 국회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치에 대한 무지의 결과다. 다수를 장악하기만 하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는 생각만큼 법치를 파괴하는 것은 없다. 이는 만인 투쟁에 불과하다.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회 쿠데타를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그리스 민주주의의 타락상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그것은 정치의 절제, 입법의 제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종걸, 유승민 의원은 부디 이 점을 오해하지 마시라.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박영실 칼럼] 리더의 이미지 가치를 올리는 퍼스널이미지브랜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1803.3.jpg)
![[한경에세이] 비상이다. 비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5991182.3.jpg)
![[허원순 칼럼] 22대 국회 '역대 최대' 법률가들의 4가지 책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0347388.3.jp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