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과장 & 李대리] "김OO님, 너 똑바로 안할래"…'님'자 붙여 존중한다더니 반말은 그대로
"崔부장님, 이건 朴차장님께서…" 헷갈리는 '압존법' 탓에 상사한테 혼쭐
![[金과장 & 李대리] "김OO님, 너 똑바로 안할래"…'님'자 붙여 존중한다더니 반말은 그대로](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AA.9819072.1.jpg)
한 방송사가 TV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연예인들끼리 욕을 섞어 언쟁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선후배들 사이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쉽게 감정이입했다”(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분석이 나온다.
띠동갑 손아래인 거래처 이 대리가 아무리 말을 짧게 해도 그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김 부장. 직장에서 만난 대학 후배에게 말을 높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신입 최 사원…. 반말과 존댓말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모아봤다.
◆‘님’자 붙여도 쏟아지는 막말
![[金과장 & 李대리] "김OO님, 너 똑바로 안할래"…'님'자 붙여 존중한다더니 반말은 그대로](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01.9820116.1.jpg)
하지만 제도를 바꾼 뒤 첫 출근 날 김 대리의 기대는 곧바로 무너졌다. “야 김님, 보고서 아직도 안 만들었어? 똑바로 안 할래?” 김 대리라는 호칭이 김님으로 바뀌었을 뿐 상사의 고성과 반말은 그대로였다. “이럴 거면 뭐하러 호칭을 바꾸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호존중요? 한 세대가 지나도 그대로일걸요?”
◆존댓말로 후배를 휘어잡는 선배
여의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장 대리(32)가 제일 신경쓰는 상사는 오 팀장(38)이다. 미혼의 여성으로 뛰어난 기업 분석 능력과 인맥,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춰 남녀를 불문하고 존경받는다. 후배를 가르치거나 혼낼 때 언성을 높이는 일도 거의 없다. 늘 조곤조곤 조용한 목소리로 세세하게 지적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오 팀장에게 인정받는 후배인지는 그가 존칭을 쓰느냐, 아니냐로 금세 알 수 있다. 오 팀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에게는 언제나 “씨, 보고서 아직 안 됐죠? 바쁘면 천천히 올려요”라고 깍듯이 존댓말을 쓴다. 하지만 일 잘하는 후배에게는 “프로, 밥 먹자”라는 식으로 반말을 한다. “존칭을 쓰는 게 후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에요. 회사에서 워낙 잘나가는 선배여서 후배들이 서로 막말을 듣기 위해 경쟁을 할 정도라니까요.”
◆대학 선배가 회사 후배로…존댓말? 반말?
대기업 3년차 직원 이모씨(31)는 작년에 신입공채로 들어온 수습사원 가운데 낯익은 이가 한 명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과 선배. 그 선배는 결국 이씨의 직속 후임이 됐다. 이씨는 “둘만 있을 때는 그냥 말을 놓으라”고 했다. “대신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존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대학 선배이자 직속 후임이 자주 사고를 쳤다. 이씨는 그때마다 곤란해졌다. 대학 시절을 생각하다 보니 따끔하게 주의를 주지 못했다. 존댓말을 듣는 것도 불편해졌다. 대화는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결국 약속이나 한듯 아예 서로 말을 안 하게 됐다.
어렵사리 취업 시장 문턱을 넘은 대기업 신입사원 최씨(30). 그는 윗사람의 존댓말이 오히려 불편하다. 매일 얼굴 마주하고 일하는 바로 위 선배들은 대부분 나이가 최씨보다 어리다. 차라리 막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일 하나 시키더라도 불편해하는 탓에 최씨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다른 동기하고 대하는 게 다르니까 저까지 민망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선배가 오히려 더 나은 거 같습니다.”
A물류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김모 대리(34). 그는 이직한 뒤 ‘호칭’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후배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더 불편하다. 나이는 동갑이거나 한두 살 어린 사원이 대부분인데, 막상 반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다른 대리들은 사원에게 편안하게 반말을 하는 상황에서 혼자 존댓말을 쓰기도 어색하다.
하루는 맘을 굳게 먹고 반말을 써보려 했더니 후배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왜 저러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혼자 민망해졌다. 김 대리는 “후배직원들에게 편안하게 반말을 쓸 수도, 그렇다고 존댓말을 쓸 수도 없는 처지”라며 “씨라고 부른 다음 이어지는 대화에선 미묘하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고 있다”고 말했다.
◆헷갈리는 ‘압존법’
환경 관련 공공기관에 다니는 김 주임(28)은 최 부장(46)에게 “이 건은 박 차장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라고 말했다가 혼쭐이 났다. 최 부장은 “박 차장이 나보다 낮은데 높여 부르냐”며 언짢아했다.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지위가 아래일 때는 높임말을 써선 안 된다는 압존법을 강조한 것이다.
최 부장의 압존법이 과연 맞는 걸까.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에 따르면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할 때 ‘~님께서’ 같은 극존칭은 피하되 ‘~께서’나 높임말 어미인 ‘~시~’는 쓸 수 있다. 김 주임이 했던 말을 “박 차장께서 지시한 겁니다”라고 하면 올바른 표현이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특별취재팀 송종현 산업부 차장(팀장) 이호기(IT과학부) 강현우(산업부) 오동혁(증권부) 박한신(금융부) 김대훈(정치부) 김인선(지식사회부) 박상익(문화스포츠부) 강진규(생활경제부) 홍선표(건설부동산부) 이현동(중소기업부) 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겁나서 휴대폰 못 만지겠어요"…3000만원 날리고 '경악'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065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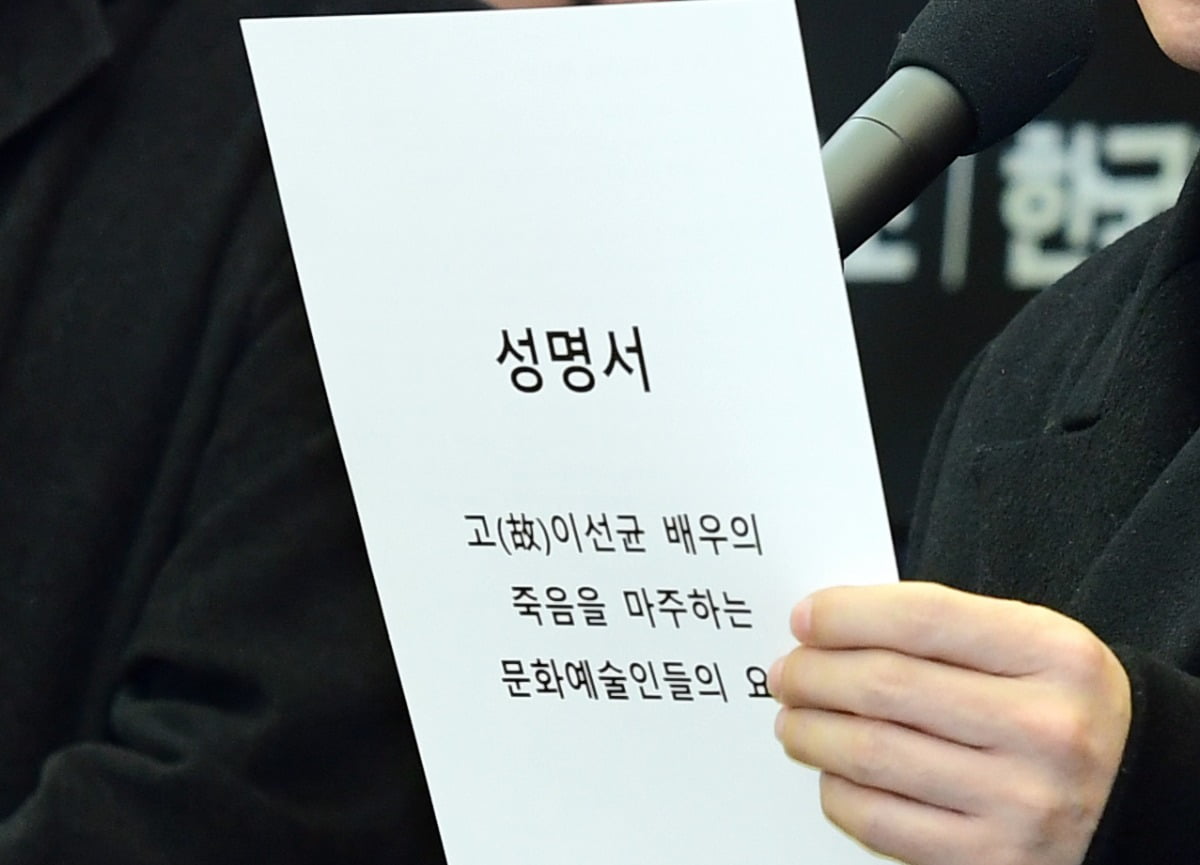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