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노사정 대타협] 임금피크제·해고 기준 '뜨거운 감자'
使·政 "반드시 법제화를"
노동계 "강행 땐 타협 불가"
![[시한 넘긴 노사정 대타협] 임금피크제·해고 기준 '뜨거운 감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AA.9771482.1.jpg)
이런 탓에 노·사·정이 3개월 이상 논의를 거듭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 저(低)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한 것으로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법제화 반대는 물론 60세를 넘은 근로자에 한해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고 맞섰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촉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반대 입장에 더해 최근 ‘근로시간 피크제’(임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도 단축) 도입안을 제시하면서 간극은 더 벌어졌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통상 해고 기준 마련은 회사가 저성과자 등을 이동 배치하거나 해고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부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연간 1만3000건에 달하는 해고 관련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우회적 정리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건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직원 재배치도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해 기업 운영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동계는 “산업 특성에 맞게 생성된 임금체계를 갑자기 흔드는 것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 삭감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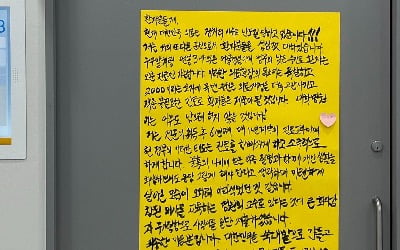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