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의 '10년 같았던 1년'
글로벌 통화전쟁 회오리
'소신과 현실' 끝없는 고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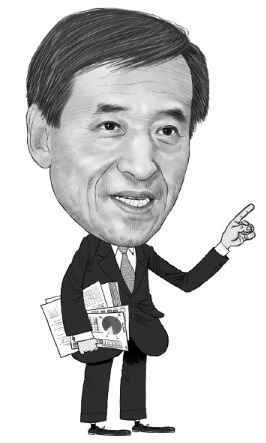
이 총재가 다음달 1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기간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연 1%대 기준금리라는 낯선 길을 열었다. 글로벌 통화전쟁에 가세했지만 뒷북은 아닌지,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은 어찌할 것인지, 고심은 그의 몫이다.
이 총재에게 지난 1년은 10년과도 같았다. 작년 4월1일 취임식 때 그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을 펴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부총재를 끝으로 물러났다가 ‘정통 한은맨’으로서 금의환향할 당시 안팎의 기대도 컸다. 당시 이 총재는 ‘인플레 파이터(fighter)’에 가까웠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에 대응해 금리 정상화를 언젠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경기도 회복세였다.
李총재, 금리인하 공개 압박 정치권에 '서운'
그는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0%로 끌어올렸다. 금리는 동결했다. 경기 부양이 급하던 정부는 아쉬워했지만 그의 소신을 거스르지 못했다.
이 총재의 소신은 예상치 못한 데서 꺾였다. 취임 직후 터진 세월호 사고로 경기가 충격을 받았다. 석 달 뒤인 7월엔 성장률 전망치를 3.8%대로 되돌려야 했다. 일본 엔화가치까지 급락하자 기업의 신음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경기부양에 팔을 걷어붙였다. 높아진 금리 인하 압박에 한국은행 안에서도 위기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 총재는 갈등보다 공조를 택했다.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과거 독립성 논란 속에 사사건건 부딪혔던 정부와 한은이 손발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총재가 취임 당시 강조했던 ‘일관성’은 상처를 입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이 총재가 취임 초기 금리방향은 인하보다 인상이라고 강조한 것은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였다”며 “이게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성장률은 작년 1분기(1~3월) 1.1%에서 2분기 0.5%로 꺾인 뒤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저유가까지 가속화하면서 디플레(지속적인 물가 하락) 초입에 왔다는 우려는 짙어졌다. 지난 12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75%로 낮췄다. 한 달 전까지도 시장에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은 안에서조차 ‘정부에 끌려가는 모양새만 됐다’는 아쉬움이 감돈다.
이 총재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언급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정부와 정치권에 서운함을 표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저유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대처해야 한다. 녹록지 않았던 1년을 거치며 이 총재의 방향은 좀 더 분명해졌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부진이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며 정부의 재정집행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은이 연 1%대 저금리로 길을 터 준 만큼 이젠 정부가 차질 없는 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다. 한은의 자존심을 희생하며 얻어낸 정책공조 성과는 미완성이다. ‘이주열호(號)’ 한은의 2년차 과제이기도 하다.
김유미/김우섭 기자 warmfron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베니스의 장인들' 르네상스 조선소에 쿵쿵쿵 망치질! 클래스가 달랐던 토즈 전시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96137.3.jpg)